
1990년대 중반, 어느 해 봄이었다. 무슨 계기에선가 아내와 함께 아침 금식을 결심했다. 소식이 건강식이고, 아침에는 식사 대신 물(水)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일본의 어떤 저명 의사 – 니시(西) 박사라 기억한다 – 의 이론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때로 주위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애꿎은 물만 – 몇 년 전부터는 사과 한 알을 곁들여! - 마시기를 어언 25년 여, 바야흐로 오전 금식은 당연한 일과가 되었고 이제는 외려 공복 상태를 즐긴다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 중 몸과 마음이 가장 가볍고 상쾌한 때가 '배고픈' 오전 중이니까.
카프카의 '단식예술가'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주인공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굶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단식 행위예술가'이다. "이 단식예술가는 단식 중에는 일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 예술가의 명예가 그렇게 하게 했다." 카프카는 도대체 주인공의 이 굶는 행위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필자에게는 "그가 아무 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무(無)를 먹는다"라고 한 라캉의 해석이 가장 와 닿는다. 카프카의 주인공은 '무를 먹음'으로써 무념무상의 절대미인 '무'를 예술가의 궁극적 지향으로 삼았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무를 먹는다'인데, 아전인수 격이 되겠지만 필자는 그것을 '물을 마신다'와 동일한 내포로 보고자 한다. 단식한다 해도 물은 마시는 것이고, 음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물은 '무'와 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필자는 매일 오전 물을 마심으로써 사실은 '무를 먹고 있다'고 해도 된다.
소식 옹호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은 문제가 많다. 이제는 '상다리가 휘도록'이라는 비유를 마냥 좋게만 볼 때가 아니지 않을까? 최근 노르웨이의 '미래를 위한 식습관'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의 음식 소비량을 기준으로 77억 명이 먹을 음식을 생산하려면 2050년에 지구가 2.3개 더 필요할 것이라 한다(매일신문 7.18, '야고부'). 그런데도 TV 채널마다 '먹방'이 넘쳐나고, '24첩 반상' 같은 시대착오적인 상차림이 참을 수 없는 식욕의 경박함을 부채질한다. 과연 그 많은 남는 반찬들은 어디로 갈까? 음식쓰레기, 아니면 재활용? 어느 쪽이든 아찔하다.
음식쓰레기만이 아니다. 빈 플라스틱 음료병과 술병 같은 것들은 또 어떤가. 왜 우리는 재활용 보증금제 같은 것을 실시하지 않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독일어로 'Pfand'(판트)라고 하는 보증금 환불제는 적어도 독일에서는 일상사가 된 지 오래다. 마트마다 재활용품 자동기계 - 'Pfandautomat'(판트아우토마트)라 한다 – 에 빈 음료수병, 맥주병 등을 하나하나 집어넣고 꼼꼼하게 환불 보증금 전표를 뽑아내는 서민들의 진지한 표정들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도 필자는 쪼르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물의 그 무미(無味), 그 무의 미를 음미해야겠다. 속이 빌수록 머리는 더 맑아진다고 했지 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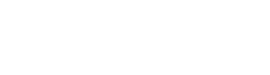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