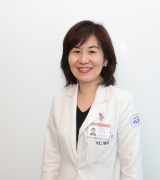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이 때문에 학원에 상담을 갔더니 시험을 먼저 치라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성적이 안좋아 근처 학원엔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성적이 안좋아서 보충하려고 학원에 가려는데, 성적이 안좋아서 갈 수가 없다니. 나는 그런 대형학원 경험이 없어 얘기를 듣는 내내 이해가 안됐다.
의사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다. 중한 환자는 덜 급한 환자를 제치고서라도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다. 여행을 갔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심지어 새벽 3시에 자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
의사가 되고 나서 생긴 버릇 내지 습관이 있다. 인턴, 레지던트 때는 휴가 때도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한번은 응급실 당직을 마치고 퇴근해 자다가 집 근처를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에 반사적으로 일어나 뛰쳐나간 적도 있다.
또 하나는 화장실을 가든 샤워를 하든 꼭 핸드폰을 근처에 둔다는 것. 환자들은 내 근무시간에 맞춰 아픈 게 아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목숨은 내가 머리를 헹구는 그 짧은 시간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적으로 아픈 사람을 보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의사라는 직업을 견딜 자신이 없어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나는 전공이 재활의학과다 보니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환자마다 사연은 어찌나 그렇게 많은지. 울지 않고 회진을 도는 날이 적었던 레지던트 1년차 때, "더는 못 살겠다. 나도 이젠 행복한 사람들만 보고 즐거운 얘기만 듣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아야겠다. 이건 아니야!" 사직서를 낼 결심으로 과장님께 가던 날이었다.
한 보호자가 뛰어 나와 나를 붙잡았다. 소아암 후유증으로 우리 과에서 보행 치료를 받는 지영이 어머니였다. "선생님, 지영이가 선생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요" 어머니 손에 끌려 들어간 병실엔 치료하기 싫다고 박박 대들던 지영이는 어디 가고, 주렁주렁 달린 수액병들 사이에 포옥 꺼진 채, 하얀 아이 하나가 밀랍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손수민 선생님 왔다"는 소리에도 말할 힘도 없는지 힘겹게 눈을 떠 5초쯤 나를 바라보더니 다시 눈을 감는다.
지영이의 눈빛 때문이었는지 나는 그날 사직서를 내지 못했고,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나가고 몇 시간 후 지영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충격이었다. 지영이가 죽어가던 순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그저 평범한, 어린 의사였다니. 다른 일을 하면서 내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절실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아직 의사로 살고 있다.
얼마 전 내가 검사로 입원할 일이 있어 외래 진료시간 변경 때문에 예약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했다가, "의사한테 개인사정이 어디 있냐"며 "검사고 입원이고 의사 개인사정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되냐"는 항의를 받았다. 의사는 공공재라는 얘기가 떠도는 대한민국에서 뭘 바라고 나는 이 나이에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샤워하나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의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다. "환자 때문에"라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내 환자, 목숨이 사그라드는 그 순간, 나를 바라보던 지영이의 그 눈빛 때문에 나는 오늘도 머리맡에 핸드폰을 두고 잔다.
손수민 영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