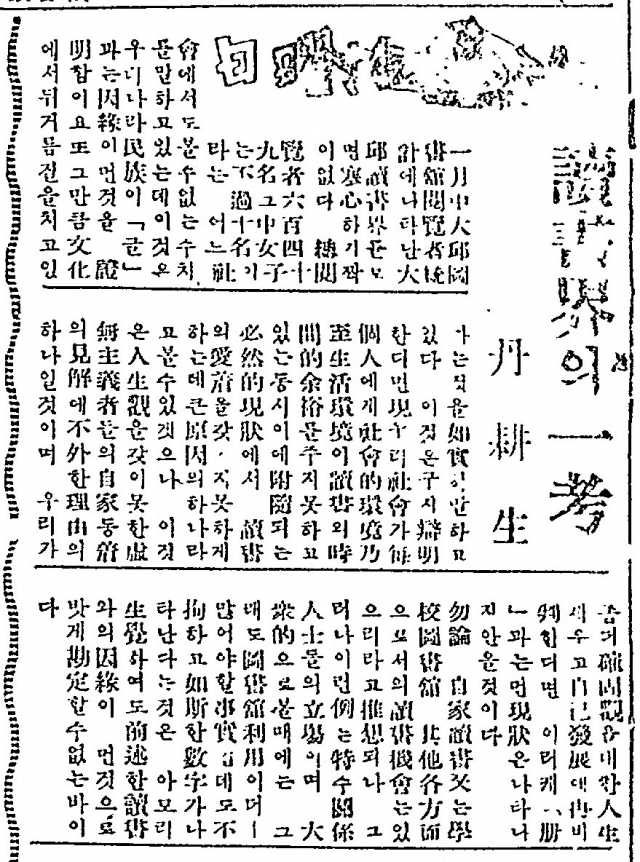
'1월 중 대구도서관 관람자 통계에 나타난 대구독서계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총관람자는 649명 그중 여자는 불과 10명이라는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수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민족이 글과는 인연이 먼 것을 증명함이요 또 그만큼 문화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하고 있다.~' (매일신문 전신 남선경제신문 1949년 2월 13일 자)
대구의 도서관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에 문을 열었다. 대구부립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경상감영공원 쪽에 있던 옛 경북도청 구내였다. 나라를 뺏긴 설움을 독서로 달래려 한 것일까. 1939년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만5천520명이 입장을 했다. 하루에 40~50명씩 도서관을 찾았다. 도서관 이용객이 갈수록 늘자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1940년 8월부터는 달성공원 앞의 조양회관을 빌렸다. 남녀별로 독서실도 따로 만들었다. 조양회관은 한적해 독서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제 강점의 사슬에서 벗어나자마자 대구부립도서관은 문을 닫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다. 일제의 유산을 끊고 독립된 나라의 새로운 도서관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도서관 개관은 더디기만 했다. 예산도 미흡한데다 책도 부족했다. 도서관의 분실된 책을 찾고 부민들을 대상으로 책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개관이 늦춰지자 한때 임시 도서관을 열 계획도 세웠다.
해방 이태가 다 된 1947년 5월 6일 도서관은 개관했다. 오전에 개관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부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우리의 손으로 도서관을 연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이었다. 당시의 신문들은 대구부립도서관의 개관을 전하면서 속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속간은 일제 때 세운 도서관의 연장이라고 봤다. 대구부립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해 독서 열기를 띄우려 일주일 동안 독서주간을 설정했다. 언론들도 도서관 개관을 주요 뉴스로 다뤘다.
무엇보다 도서관 개관을 반기는 이들은 학생들이었다. 날마다 200명이 넘는 열람자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도서관이 아니면 보고 싶은 책을 볼 데가 없었다. 해방 이후 본격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린 이유도 컸다. 그런데도 열람자 중에 여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여성이 공부하는 것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알 수 있다.
도서관을 찾은 열람자들은 수학과 물리, 화학 등 이학 계통의 책을 즐겨 봤다. 국사와 철학 외에 사회과학이나 문학도 빠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들어온 신간 잡지와 논문 등을 찾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패망을 가져온 원자탄 관련 책의 인기였다. 문학과 경북도의 자연을 기술한 책이 압도적으로 인기였던 해방 전의 독서 패턴과는 달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구독서계에 대한 시각이 기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도서관 개관 때보다 턱없이 이용객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1949년 11월의 경우 한 달간 총 관람자는 640여 명에 그쳤고 여자는 10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도서관 외에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데다 고달픈 민생고도 도서관을 멀리하도록 했다. 게다가 높은 문맹률도 한 이유였다. 경북도만 하더라도 문맹 퇴치를 위해 5만 명을 상대로 한글 강습을 시도할 정도였다.
해방 후 60~70%에 달하던 문맹률이 떨어지면서 도서관 이용객은 차츰 늘었다. 1980년대 초에 문맹률은 5% 정도였다. 까막눈이 사라진 것이다. 불과 40년 전의 일이었다. 지금이야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은 없다. 염치를 모르는 까막눈이 넘칠 뿐이다.

박창원(톡톡지역문화연구소장‧언론학 박사)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