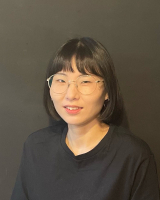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에 금세 체력이 바닥나고 지칠 때면 나는 무엇보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이 절실해진다. 터덜터덜 카페로 들어가 막 나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크게 한 모금 들이켜면 강렬하고 쌉쌀한 맛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 과연 커피는 악마의 열매라 불릴 만하다.
커피 애호가는 아니지만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이긴 하다. 종종 친구들과 맛있는 커피를 찾아 카페 투어를 하기도 하고 새로 생긴 카페가 보이면 꼭 한 번은 들러 맛을 보기도 한다. 미묘하게 다른 커피들 속에서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커피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커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계기가 있다. 아직도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다. 내가 대학생이던 오래 전의 일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을 하시고,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서빙을 하는 테이블이 다섯 개 남짓한 작은 카페가 있었다. 조용하고 늘 커피향이 가득한 그곳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자주 드나들곤 했다.
다른 손님이 없는 어느 조용한 오후, 혼자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쓰읍 쓰읍'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카페 안을 둘러보니 바에서 사장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사장님은 작은 컵 세 개에 분쇄한 원두를 담아 물을 부은 후 스푼으로 떠서 '쓰읍' 소리를 내며 커피의 맛을 보고 있었다. 신기하게 보고 있었더니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커핑 중인데 와서 한번 해보겠냐고 나를 불렀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커핑(Cupping)'은 커피의 향과 맛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커피 샘플의 전반적인 품질과 개별 특성을 수량화해 분석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작업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당시의 나는 그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커피를 맛보고 질문에 답했다.
사장님은 각각의 커피에서 어떤 향과 맛이 나는지 질문하셨는데, 막상 정확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대화를 이어갔던 기억이 난다. 예를 들어 내가 "과일향이 나요"라고 하면 사장님은 "오렌지인가요, 레몬인가요?"라고 다시 묻고, 내가 "신맛이 강해요"라고 하면 사장님은 "1에서 5중에 어느 정도 신맛인가요?"라고 되묻는 식이었다.
처음 접하는 경험에 신이 나 한참을 맛본 후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세 잔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은 커피인가요?"라고 여쭤보았다. 사장님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셨다. "세 잔 다 좋은 커피에요. 다르게 좋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세 잔의 커피에 등수를 매기고 줄을 세우려 했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졌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다.
그날의 커핑 체험 이후 커피 전문가로 거듭났다거나 하는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커피에 대해 잘 모르지만 커피의 맛과 향을 느끼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