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잤더니
어이타 봉황은 꿈이었다 안 오시뇨
달맞이 가잔 뜻은 임을 모셔 가잠인데
어이타 우리 님은 가고 안 오시느뇨
하늘아 무너져라 와르르르르~
잔별아 쏟아져라 까르르르르♬
가수 김도향이 부른 노래 '벽오동 심은 뜻은' 가사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에 뜻도 잘 모르는 가사를 따라 흥얼거린 적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봉황을 간절하게 기다릴까.
◆봉황의 쉼터 벽오동
전국시대 제자백가 장주(莊周)가 쓴 『장자』의 「추수」편에 "남방에 원추(鵷鶵)라는 새는 벽오동이 아니면 앉지도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도않는다"(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飮)는 구절이 나온다. 원추는 상상의 새 봉황을 말하며 봉황이 앉아 쉬는 상서러운 나무[祥瑞木]가 오동(梧桐)이다. 연실(練實)은 빨라야 60년에 한 번 맺힐까 말까 한 대나무 열매이며 예천(醴泉)은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에만 솟아나는 샘을 말한다. 한마디로 봉황은 성군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는 전설의 새다.
전설의 봉황이 앉아 쉬는 오동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오동나무가 아니라 벽오동(碧梧桐)을 일컫는다. 보통 오동나무는 속이 희기 때문에 백동(白桐)이라 부르고 벽오동은 껍질이 푸르기 때문에 청오(靑梧) 혹은 청동목(靑桐木)이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 선비인 유박이 쓴 『화암수록』의 「화목구등품제」에는 오동나무를 6등에 넣고 평하기를 "벽오동이 좋은 품종이다, 화분에서도 덮개 모양으로 기르기에 좋다"라고 했을 정도로 오동나무와 벽오동을 구분하지 않았다. 나무 이름이나 목재 쓰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나무이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오동나무는 현삼과고 벽오동은 벽오동과다. 한자 '梧'(오)의 오동은 벽오동을 뜻하고 桐(동)은 오동나무를 뜻한다. 봉황이 쉬어가는 오동은 모두 벽오동으로 보면 된다. 오동나무로 악기를 만들 듯이 벽오동도 거문고와 비파를 만드는데 귀중하게 사용됐다. 특히 벽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를 '사동'(絲桐)이라고 불렀다.

벽오동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줄기가 푸르고 윤기가 나며 자라는 속도도 빠르다. 한 해에 1m 정도 쑥쑥 크고 높이가 15~20m까지 자란다. 줄기에 가지가 자란 흔적을 세보면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늦봄에 잎이 돋아날 때 주황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새잎에 돋아난 털의 색깔 때문이다. 다 자란 이파리도 오동잎처럼 넓고 손가락처럼 잎 가장자리 끝이 3~5개로 갈라진다. 여름이 시작 될 무렵인 6월에 엷은 노란색을 띠는 꽃이 가지 끝에 피어 풍성한 꽃차례를 이룬다. 10월 무렵 아래로 오므린 듯 바람개비 모양의 날개에 맺힌 콩 같은 열매가 4, 5개 익는다. 열매는 한약재나 볶아서 커피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입추가 지나면 벽오동 잎이 점차 노랗게 물들어 한 잎씩 지기 시작한다. 이즈음에 옛 사람들은 "벽오동 잎 한 장이 떨어지니 세상에 가을이 다가왔음을 안다"(梧桐一葉落 天下盡知秋)고 표현했다.
◆봉황 등장하면 벽오동도 소환
봉황이 쉬는 터전이 벽오동이니 옛날 문장이나 글에 실과 바늘처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한석봉의 천자문에는 '鳴鳳在樹 白駒食場'(명봉재수 백구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봉황이 나무에 앉아 울고, 망아지 같은 네발 달린 짐승들도 사람을 잘 따르게 된다는 의미다. 여기서 봉황이 앉아서 쉬는 나무가 바로 벽오동이다.
고려 문장가 이규보(李奎報)가 쓴 「詠桐」(영동·오동나무를 읊다)에는 봉황이 오지 않으니 자못 한탄조의 심기가 배어 있다.
漠漠陰成幄(막막음성악)
넓고 넓은 그늘 장막을 이루더니
飄飄葉散圭(표표엽산규)
나부끼는 잎사귀는 모처럼 흩어지네
本因高鳳植(본인고봉식)
본래 봉황 보려고 심었는데
空有衆禽棲(공유중금서)
부질없이 잡새들만 깃드네
조선시대 문장가 송강 정철은 식어버린 선조 임금의 사랑을 다시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飜曲題霞堂碧梧」(번곡제하당벽오·하당의 벽오동을 번곡하여 적다)라는 시를 썼다.
樓外碧梧樹(누외벽오수)
다락 밖에 벽오동나무 있건만
鳳兮何不來(봉혜하불래)
봉황은 어찌 안 오는가
無心一片月(무심일편월)
무심한 한 조각달만이
中夜獨徘徊(중야독배회)
한밤에 홀로 서성이는구나
봉황이 벽오동에 내려앉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벼슬에서 쫓겨나 변방에 떠도는 자신을 임금이 다시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나라와 임금을 동일시하던 왕조시대에 '성은이 망극'할 정도로 임금을 사랑했거나 사랑하는 척이라도 했던 선비들은 그들의 공간인 서원이나 향교에 벽오동을 한 두 그루 심고 가꿨다. 깨끗하고 푸르며 줄기는 곧게 올라가 절개 높은 선비 정신과도 잘 부합돼 봉황의 쉼터를 조성한 것인데 여기에는 너른 잎이 햇빛을 가려줘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실용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조선 중기 퇴계의 제자이자 문신인 학봉 김성일(金誠一)은 퇴계 사후 도산서원에 들러 스승을 그리워하는 시 「陶山梧竹滿庭 乘月徘徊 感淚潸然」(도산오죽만정 승월배회 감루산연)을 읊었다.
幽貞門掩暮雲邊(유정문엄모운변)
저녁 구름 떠 있는 가에 유정문은 닫혀 있고
庭畔無人月滿天(정반무인월만천)
사람 없는 뜨락에 달빛만 가득 하네
千仞鳳凰何處去(천인봉황하처거)
천길 높이 나던 봉황은 어디로 가셨나요
碧梧靑竹自年年(벽오청죽자년년)
벽오동과 푸른 대나무는 해마다 자라는구나
퇴계를 봉황에 비유하고 품격을 천길이나 된다고 표현했다. 높은 도덕성과 심오한 철학을 가르치며 일생을 살다간 스승을 눈물로 추억했다.
태평성대를 갈구하고 존경하는 스승을 그리워할 때만 봉황과 벽오동을 말한 것은 아니다. 판소리 「열녀춘향수절가」에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하는 대목에도 등장한다. "단산(丹山) 봉황이 죽실(竹實) 물고 오동(梧桐) 속에 넘노는 듯 구고(九皐) 청학(靑鶴)이 난초를 물고서 오송간(梧松間)에 넘노는 듯…" 전설의 새 봉황과 천하가 태평할 때만 운다는 청학만큼 그들의 사랑을 환상적으로 멋스럽게 보았기 때문에 최고의 비유를 했으리라 짐작한다.

◆화투 11월 그림은 봉황과 벽오동
대구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봉무동(鳳舞洞)에도 봉황과 오동나무에 관한 얘기가 있다. 예로부터 오동나무가 많았던 이 마을의 원래 이름은 '동수'(桐藪)다. 조선 후기에 정자 곁에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구덩이를 팠더니 땅속에서 봉황이 나와 북쪽으로 날아가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종 12년(1875년) 성리학자 봉촌(鳳村) 최상룡(崔象龍)이 봉무정(鳳舞亭·대구시 유형문화재 제8호)을 짓고 주위에 오동나무와 대나무를 심어 인과 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구상했다고 한다.

대구 앞산에도 벽오동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특히 고산골 맨발로 걷는 길의 남쪽 편에 도열하듯이 늘어선 수백그루의 벽오동은 가을에 열매를 매달고 우뚝이 서있어 청명한 하늘과 함께 장관이다.
우리는 봉황을 화투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화투의 11월을 상징하는 '똥광' 그림의 닭과 비슷한 새가 봉황 머리다. 흔히 화투의 봉황을 '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께 그려진 '오동' 잎을 짧게 발음하다보니 '똥'으로 부르게 됐는데 실제로는 벽오동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휘장 속의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꼬리 긴 새가 봉황이다. 그런데 봉황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화투의 그림과 청와대 휘장의 이미지는 천양지차다.
난세에 태평한 시대를 상징하는 봉황을 기다리는 게 옛 사람들이었다. '과학의 시대'에 나무 벽오동을 보면서 '전설의 시대' 새인 봉황을 떠올려 보는 낭만도 괜찮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것이 곧 태평성대다. 우리가 꿈꾸는 대통령을 기다리며 내년 봄에 벽오동 한 그루를 심고 싶다.

편집부장 chungham@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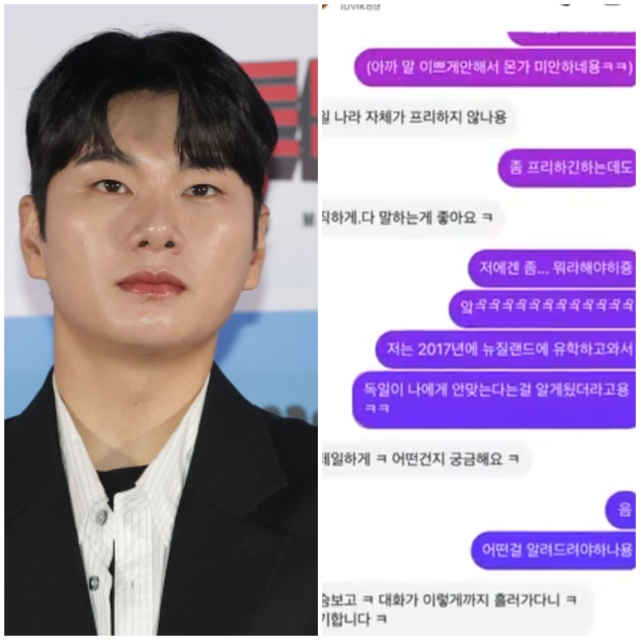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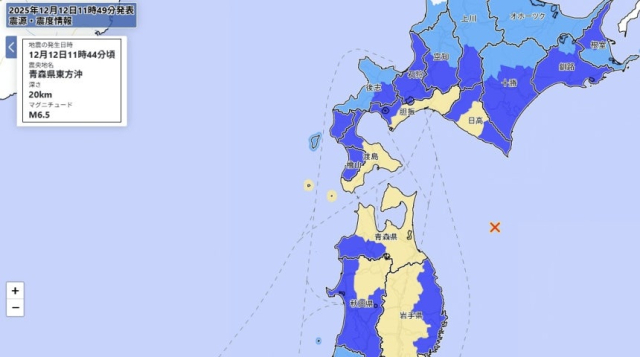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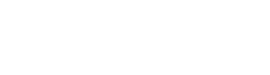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