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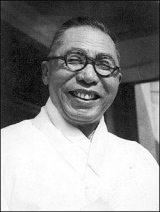
내 과거의 70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 평생을 설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왜 그런고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김구(대한민국장) 주석은 중국 망명 시절 쓰고 광복 이후 1947년 서울에서 펴낸 『백범일지』에서 '나의 소원'이란 글로 '독립된 나라의 백성'을 바랐던 절절한 심정을 밝혔다. 독립은 이완용 등 매국 친일파를 뺀 한국인, 특히 항일 투사의 꿈이다. 그랬으니 세상의 인연과 만남, 활동 등 온갖 것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했으리라.

◆감옥서 의형제 맺고 항일투쟁
대한제국 관리인 아버지 정환직(대통령장)의 명을 받아 1906년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 산남의진을 일으켰다가 투옥된 아들 정용기(독립장) 의병장을 대구감옥에서 만난 대구진위대 참교 우재룡(독립장)은 1907년 병영을 벗어나 의병에 투신했다. 수감된 정 의병장과 의형제 인연을 맺고 정 의병장 진영의 연습장이 된 우재룡은 험난한 독립 전쟁에 합류했다.
이어 1907년 산남의진 정환직 2대 의병장의 선봉장이 된 우재룡은 1908년 3대 최세윤(독립장) 의병장 아래 팔공산 일대에서 활동하다 붙잡혀 종신형으로 수감 중 1910년 병합 뒤 풀려났다. 그리고 1915년 대구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대한)광복회 지휘장으로 재기했던 그는 1920년 또다시 붙잡혀 원산형무소에서 18년을 살다 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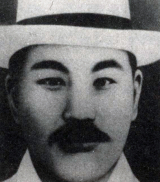
과거 친일단체인 일진회에 몸 담았던 전협(애국장)은 1911년 서대문감옥에 수감된 김좌진(대한민국장)을 만나 의기투합해 의형제를 결의했고 뒷날 독립운동에 동행했다. 광복회 지도자 박상진 총사령도 1916년 대구감옥에서 만난 강원도 출신 김동호(애족장)를 만나 의기(義氣)가 통해 뒷날 광복회의 강원도지부장의 중책을 맡기게 됐다.
중국 망명 전 서대문감옥에 갇힌 임정 김구 주석 경우, 의병장 출신 이진룡(독립장)의 족제(族弟)로 일제 앞잡이 노릇하다 이진룡에 의한 사형 직전 참회해 이진룡을 도운 이종근(李鍾根)을 만나 2년 동안 글을 가르쳐 감화시켰다. 김구는 또 인천감옥과 서대문감옥에서 만난 인사들 특히 한인 범죄인들에게서조차 독립운동에 도움될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였다.
1908년 일제가 개입한 근대 형식의 감옥은 처음 8개 본감과 8개 분감이었으나 항일 투사의 저항으로 계속 증설해 전국 감옥은 28곳(1938년)으로 급증했다. 탄압과 감옥 증설에도 애국지사의 독립운동은 이어졌고, 감옥 안팎 어디에서든 수처작주(隨處作主·머무는 곳이 곧 주인)의 자세로 만나는 이마다 독립운동에 나서게 했으리라.

◆학교 설립 민족의식 일깨워
나라 안에서는 일제의 핍박과 탄압, 차별로 한국인 교육은 이뤄질 수 없었다. 일제 치하 한국인 80%가 문맹(文盲)이었다는 연구는 일제의 한국인 영구지배를 위한 음흉한 음모를 알려준다. 법과 제도에 의한 교육 차별은 한국인의 배움의 기회를 막고 일제에 순종하는 충량(忠良)한 신민(臣民)으로 만들기 위한 속셈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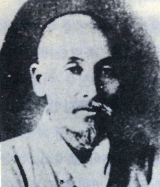
그렇지만 애국지사의 학교 설립 열정은 뜨거웠다. 1905년 군수 사퇴 뒤 경북 고령에서 1911년 일신학교를, 1920년 대구 상인동에 덕산학교를 각각 세운 윤상태(독립장), 1921년 대구의 우현서루에 공간을 마련해 교남학교(현 대륜학교)를 설립한 3인의 애국지사 김영서(애족장)·정운기(미서훈)·홍주일(애국장) 등이 그렇다.
이런 일은 대구경북과 전국에서 마찬가지였다. 정규 학교 설립을 막으면 야학(夜學)을 통한 교육에도 나섰다. 야학도 탄압받았지만 한국인의 교육 열정은 꺾기지 않았고, 한인 이주가 몰린 중국에서도 그랬다.
1916년 일제의 조사 통계는 그 사례로, 당시 중국 간도 한인학교는 182개교였고 순민간인 설립이 83개교였다. 종교계가 세운 곳은 99개교, 기독교 71개와 천주교 9개, 공교회 8개, 단군교 5개, 대종교 3개, 시천교 2개, 천도교 1개교였고, 전체 학생은 3,836명이었다. 북간도 최초 설립 학교인 1906년 10월 용정의 서전서숙(1907년 4월 폐교 뒤 1908년 명동학교 개칭) 이후 늘어난 망명지 학교 설립은 독립을 위한 교육열을 말해준다.
이들 학교에서는 민족교육과 함께 독립군가도 가르쳤고, 이를 배운 학생들은 다시 노래를 전파, 독립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주터를 다진 중국의 망명지 설립 한인 학교와 민족의식 교육, 항일가요(독립군가) 전파와 확산은 또다른 독립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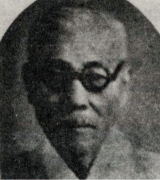
◆ '상회' 운영 군자금 마련
망명 때 중국을 누비며 앞선 문물을 목격한 김구 주석은 『백범일지』에서 옛 조선 지배층을 비판했다. "…우리의 선인들이 사절로 다닐 때 그들은 거의 모두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던가. 국계(國計) 민생(民生)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어찌 통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실제에 아무 이익도 없고 불편 고통스럽기만 한 망건입자(笠子) 등 망종(亡種) 기구들만 수입해 따랐으니…생각만 해도 이가 신 노릇이다.…주희 학설 같은 것은 주희 이상으로 공고한 이론을 주창함으로써 사색당파가 생겨 여러 백년 동안 다투기만 하다가 민족적 원기가 소진되어 남는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선지 애국지사는 신분 차별과 사농공상(士農工商)을 고집한 조선조 옛 선인들과 달랐다. 공론(空論)에 빠져 천시한 상업으로 군자금을 마련했고, 상업 조직은 국내외 독립운동을 잇는 연결망(網)이 됐다.

서상일(애족장)과 박상진(독립장)은 대구에서 각각 태궁상회와 상덕태상회,윤상태(독립장)는 경북 칠곡 왜관에 향산상회를, 안희제(독립장)는 부산에 백산상회, 경북 영주에서는 박제선(애국장)과 권영만(독립장)이 대동상점을 설립했다. 경북 고령의 박광(애족장)이 만주 안동에서 신동상회를, (대한)광복회원 손일민(애국장)은 만주에서 안동여관을 운영하는 등 이런 활동은 숱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