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에 사는 지인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했다.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전화를 끊으려는데 인사말이 귀에 꽂힌다. "매화 지기 전에 한번 와라."
아, 매화 피는 계절이었지! 지금은 매화를 볼 수 있는 음력 2월, 매견월(梅見月)이다. 매화가 지금 피었어요? 지기 전에 보려면 언제까지 가야 해요? 하는 것들을 물으며 다이어리의 일정을 훑었다. 매화가 피는지 지는지, 봄이 오는지 마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계절 소식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졌다. 며칠 새 봄비라도 내리면 꽃송이가 다 떨어지겠다 싶어서 더 그랬다.
'선상관매도', '백매', '매작도', '매죽도'… 모두 조선 후기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가 매화를 소재로 삼은 그림들이다. 그의 매화 사랑은 지극하다. 한번은 김홍도가 그림 사례비로 3천 냥을 받아 2천 냥으로 매화나무를 사고 남은 돈 대부분으로는 큰 잔치를 열어 벗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매화를 감상했다고 한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매화이기에 2천 냥이나 주고 샀느냐며 벗들이 묻자 매화는 군자의 벗이니 벗을 얻는 데 2천 냥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비단 김홍도뿐만 아니라 옛 선비들은 매화가 피는 때를 기다려 술자리를 갖는 풍류를 즐겼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한 선배님은 매년 봄이면 꼭 한 번은 고향 매화밭에서 잘라 온 매화 가지를 건네주셨다. 흰 꽃망울 달린 매화 가지를 화병에 꽂아 두면 열흘은 향기가 좋을 거라며 성실히도 봄마다 챙기셨다. 실제로 밖에 나갔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맑고 그윽한 향기에 절로 심호흡하게 되고, 일하다 문득 작고 소담한 꽃송이가 눈에 들어오면 새삼 마음이 환해지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호사스럽게 봄을 누리던 때가 있었구나 싶어 그때의 봄날이 애틋하고 그립다.
조금이라도 지나버리면 못 누리는, 딱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매화가 피고 지고, 산수유가 피고 지고, 목련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차례로 피고 지는 그런 때가 그렇다.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자라는 아이의 모든 때가 그렇고 한 살, 두 살, 세 살… 나이 먹어가는 우리 모든 날이 그렇다.
'아, 매화 피는 계절이었지!' 화들짝 놀라며 뒤늦게 계절을 가늠하는 나의 사정과 상관없이 봄날은 무심히 갈 것이며 꽃잎은 바람에 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날도 무심히 지날 테다. 그 와중에도 무엇을 눈에 담고 누구의 손을 잡고 무엇을 가슴에 남길지는 제각각 모두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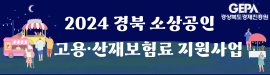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