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나 다름없던 터였다. '선한 의지'로 시작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부터 시작해 하루 평균 33만 명 이상이 찾았다. 매일 700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다.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 청원을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답했다.
그러나 좋은 제도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 분열의 장이라는 지적이 늘 따라다녔다. 여과 없는 팬심이 문제였다. 야당 국회의원, 법관 탄핵에도 무람없었다. 여당과 척진 이들을 배격하는 정당성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 게시판이 따로 없었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가 청원으로 올라왔다. 청원 추천도 10만 명을 돌파했다. 기가 찬다. 이러자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는가. 코로나19 시국에 병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숨진 정유엽 군의 2주기가 19일이었다. 정유엽 군 부모는 그간 대통령과 면담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읍소했다.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이었다. 청원에 7천36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4년 동안 존속했어야 될 운명이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던, 퇴근길 시장에서 서민들과 대폿잔을 함께 들겠다던 대통령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됐다. 국민 소통 창구라는 본연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존폐 여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는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직접 듣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팬덤에 갇혀 지내면 정말로 나라를 마음대로 하게 된다. 앞선 정부의 실정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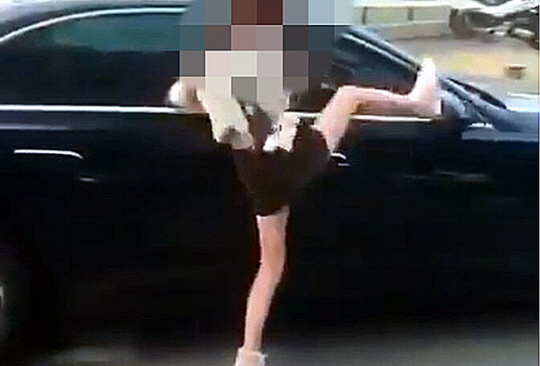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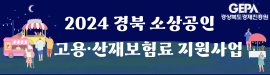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유승민 "이재명 유죄, 국민이 尹 부부는 떳떳하냐 묻는다…정신 차려라"
스타벅스도 없어졌다…추락하는 구미 구도심 상권 해결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