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흉폭한 소식을 듣고 있다가 문득 전쟁의 기록에 대해 잠시 생각해본다.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전쟁도 결국은 기록(記錄)으로만 남는다.
전쟁의 승패는 차지한 땅의 비옥함이나 승전을 올린 군사의 함성이 아니라 오직 기록의 유·불리로 판별된다. 그래서 전쟁의 기록은 '얼마나'를 중심으로 기술돼야 한다. 얼마나 죽였고(혹은 죽었고) 얼마나 뺐었고(혹은 빼앗겼고) 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혹은 견뎠는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 헤아리고 셈하고 잰다.
한편 전쟁은 피아(彼我)의 충돌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我)'는 수없이 분열해 그만큼의 하위 피아를 다시 생산한다. 유리한 기록에 자주 이름을 올리기 위해 기록자들은 인과가 분명치 않고 목적이 어긋난 문장으로 끊임없이 '아'를 쪼갰다.
이런 의미에서 난중일기의 전쟁 기록법은 생소하고 감동적이다. 정유(丁酉)년에 벌어진 조선 수군의 큰 전투는 총 두 차례였다. 한번은 이순신이 권율의 수하에서 백의종군하고 있던 7월에 벌어진 칠천량전투고, 나머지 하나는 그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관된 후 직접 선봉에 나선 명량해전이다.
이 두 전투가 벌어진 날 밤에도 이순신은 일기를 썼다. 그는 패장 원균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고, 다급히 찾아온 권율의 초라한 계산을 글로 옮겼지만 비아냥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잿더미로 변한 함대를 추슬러보겠다는 결정을 권율의 안도 앞에 기술했지만 어떠한 절망의 말도 남기지 않았다.
330척의 적선이 좁은 해협을 가득 채웠을 때, 폐선과 다를 바 없는 13척의 함대를 이끌고 명량의 거친 물살에 배를 띄웠다는 일지는 있지만 울돌목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최후를 맞겠다는 비장한 유서는 없었다. 달아나는 장졸들을 붙잡아 윽박지르는 목소리는 있지만 빗발치는 총포 속에서 혹여 배를 물릴 수도 있다는 나약함은 적지 않았다. 실로 기적 같은 승리를 '천행'으로 돌려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기진맥진한 육신이 앓는 소리는 내지 않았다.
충무공의 글쓰기가 그의 전승만큼이나 위대한 이유는 전쟁과 임무를 끊임없이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록은 과감히 생략했다는 점이다. 실제 여타의 전쟁 기록은 이순신이 생략하고자 애썼던 부류들에서 채워지는 법이다. 공(功)을 보고하기 전에는 예의 엄살이 앞장을 서고, 과(過)를 조아릴 때는 변명을 우물거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구차한 중언부언을 생략한 난중일기의 문장은 차갑고 구성은 기계적이다. 난중일기처럼 오랜 세월을 두고 일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작성된 글은 글쓴이의 사고를 여실히 대변할 수밖에 없다. 난중일기의 글 속에는 인간의 솟아오르는 감정과 장수의 성급한 예단을 억누른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개전 초기부터 노량의 마지막 해전까지 이순신의 함대가 적을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짓누른 전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의 함대는 언제나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삼십 배가 넘는 전력의 차이를 감내한 채 서글픈 출항을 해야 했다. 그 순간 격군들이 헤치는 물살을 바라보며 이순신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이순신의 모든 전투는 맨몸으로 미지의 세계에 발을 내딛는 탐험에 다름 아니었을 것이다. 실로 이순신은 지는 것이 마땅한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하늘 아래,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는 비기(秘技)가 어딘가에 있다면 이순신은 그 어딘가를 다녀온 장수였다.
우리가 난중일기를 통해 진실로 보아야 할 것은 이순신이 다녀온 그 '어딘가'일 것이다. 실오라기 하나에 의지한 조선의 현실에서 단 한 번의 패배가 조선의 패망과 직결된다는 다급함을 이순신은 '일상성'의 유지로 극복했다. 바다의 일기(日氣)를 살피고 공무를 챙기며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자식으로서 아비로서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그의 집념에 가까운 일상성이 난중일기에 그려져 있다. 바로 그 단호한 일상성의 유지는 이기기 위한 혹은 질 수 없는 고된 현실 앞의 마지막 계책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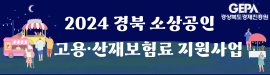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