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는 IMF 외환위기로 풍파를 겪으며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남주인공 백이진은 부자였던 집안이 망해 대학을 중퇴하고 신문 배달을 하며 어렵게 살아야만 했다. '신문 사절'이라 쓰여 있는 집에 신문을 넣으면서 시작되는 여주인공 나희도와의 '러브 라인'은 어릴 적, 신문 배달원의 "신문이요"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아침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다. 지금이야 스마트폰이나 PC로 가장 관심 가는 제목만을 선택해 기사를 접하고 연관된 다른 기사들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사를 접하지만, 그 당시 지면 순서에 따라 신문을 읽고 나면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듯한 뿌듯함을 주었다.
온라인을 통한 뉴스 소비가 주로 이뤄지고, 종이신문 구독자가 많이 줄어든 요즘도 하루를 기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신문의 기능은 종이에서 포털로 옮겨갔을 뿐 그 영향력은 여전하다. 하지만 신문사들의 기본 논조와 성향이 유력 정당의 지지층처럼 딱 갈라진 언론 환경은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만을 원하는 구독자와 상충될 때도 있다. 정파적 성향이 편집을 지배할 경우, 구독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중심에 놓고 기사를 선택하는 일명 '정파적 신문 읽기'에 몰입하게 된다.
"나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남긴 명언이다. 독립 초기, 정파 간 갈등을 몸소 체험한 그가 자유 언론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새삼 알게 해준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할 것인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는가 묻는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따듯하고 감동적인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이 금방 사라져 버려 아쉬울 때가 많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기사들을 모아 한 권의 양서처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신문사에서 매년 12월 31일 그해의 따듯하고 감동을 준 기사만을 모아 부록으로 '올해의 신문'을 발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여전히 종이신문을 애용하고, 갓 배달된 신문에서 나는 그 익숙한 냄새에 길들여진 애독자를 위해서 말이다.
종이신문은 사라져도 신문 콘텐츠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다. 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세상이 변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 마음에 울림을 준 기사들을 스크랩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내 인생의 팔할은 신문이 선생이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보며 시작하는 하루의 루틴이 살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넘기며 만나는 감성과 우리 사회의 여론을 직시하고 평가하는 재미는 꽤 쏠쏠하다.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다. 홍수처럼 기사가 쏟아지고 가치관과 취향이 미디어를 선택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하루 정도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신문과 함께 우리 사회의 따듯함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올해의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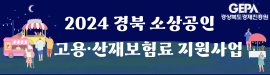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