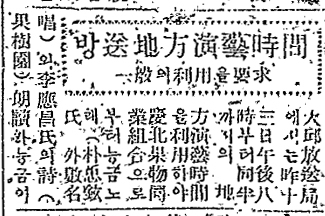
'대구방송국에서는 작 13일 오후 8시부터 동반까지의 지방 연예 시간을 이용하여 경북 과물동업조합으로부터 능금 노래(박혜현 씨 외 수명 창)와 이응창 씨의 시(과수원) 낭독과 능금 이야기, 동(능금) 타령 등의 선전과 소개방송을 하였다는데~ 학원이나 직장 또는 일반에서는 많은 이용 해줌을 요망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료도 필요 없다고 한다.'(매일신문 전신 남선경제신문 1948년 2월 14일 자)
저녁 8시부터 30분씩 이틀마다 대구방송국의 연예방송이 신설됐다. 부민들이 직접 출연하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이었다. 출연자들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시를 낭독했다. 과물동업조합의 직원은 능금노래를 불렀고 또 다른 직원은 과수원 시를 낭독했다.
출연자 중에는 직장인이 많았다. 이유가 있었다. 일반 부민들은 섭외 자체가 어려웠다. 방송에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출연 요청을 해도 선뜻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돈 안 내도 된다는 말을 부민들은 믿지 않았다.
출연자 걱정이 필요 없는 주민참여 방송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 경연대회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둘 편성됐다. 합창, 독창,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같은 경연을 방송했다. 경북 중학생 음악대회나 콩쿨대회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이태 뒤 대구 만경관에서 열린 남조선 유행가 콩쿨대회는 적잖은 인기를 끌었다.
작곡가인 박시춘과 이재호 등이 심사를 봤다. 꽃마차, 울며 해진 부산항, 목포의 눈물 등이 지정곡이었다. 입상자는 상금과 레코드 제작을 부상으로 받았다. 또 방송국 소속의 전속가수로 활동할 수 있었다.
미군정 아래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송의 증가는 이유가 있었다. 미군정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부민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얻는 수단으로 방송을 활용했다. 음악프로를 늘리고 경북도의 미국인 공보과장이 방송에 출연해 피아노 연주를 한 것도 그런 사례였다. 미군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하려 했다. 이를 위해 지방 뉴스와 향토 소식도 늘렸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식량난 같은 경제문제와 분단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등의 불만을 완화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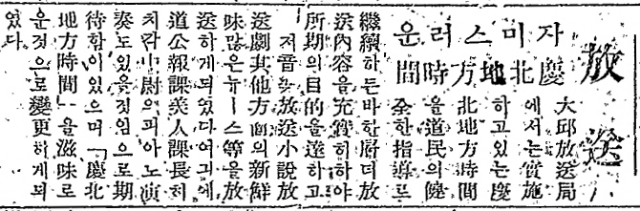
경북도지사나 경북경찰청장 등은 수시로 방송에 나와 현안을 설명했다. 1947년 6월의 경우 최희송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민에게 고함'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이즈음에는 기생들의 강제 검진을 둘러싸고 기생들과 당국의 갈등이 격화되던 때였다. 식량난과 집값 급등으로 주민들의 고통도 여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단정 반대 등으로 이어지는 학원의 동맹휴학 등도 수시로 벌어졌다. 관기와 식량, 토지, 학원, 언론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해를 구하려 했다.
당시는 라디오방송이 방송의 전부였다. 애초 조선의 라디오방송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2월 서울에 경성방송국이 설립되었다. 호출부호가 JODK였다. 방송의 관리자는 일본인이었다. 황민화 정책을 수월하게 하려고 조선에 방송국을 세웠다. 방송은 식민통치를 강화하는 선전 수단이었다. 징용이나 중일전쟁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는데 방송을 활용했다. 일본제국이나 천왕의 선전방송을 일삼았다.
대구의 경우 라디오방송은 1941년 4월에 첫 전파를 탔다. 대구시 원대동에 설립된 대구출장소였다. 일제가 제2차 지방방송망 확충을 하는 시점에 이중방송국으로 신설되었다. 이중방송은 조선어와 일본어로 하는 방송을 일컫는다. 조선인과 일본인 청취자의 증가를 꾀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해방 이후 방송의 독립성을 인정 받는데는 몇 해가 더 걸렸다. 1947년에야 ITU(국제전기통신연합)로부터 HL이라는 호출부호를 배당받았다. 방송 주권을 획득한 것이었다.
그 시절 라디오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중품이었다.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는 사치품이었다. 처음에 라디오가 나왔을 때는 대당 90원을 넘나들었다. 쌀 한 가마니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또 지금의 시청료처럼 라디오 청취료가 있었다. 라디오가 있는 집은 대문에 문패를 달듯 표시를 하기도 했다. 청취료를 받기 위해서였다. 청취료를 아끼려고 몰래 듣다가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듯 1947년에는 청취료가 40원까지 치솟았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본국에 10만대 이상의 라디오 공급을 요청했다. 대부분은 공공기관용으로 할당되었다. 일반인들은 돈이 있어도 라디오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다.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라디오의 보급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 라디오에서 텔레비전으로의 전환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TV가 나오기 전까지 라디오는 단연 인기가 있었다. 뉴스는 물론 음악과 소설방송극의 애청자가 많았다. 라디오로 들려오는 소설 낭독에 동네 사람들은 심취했다. 평상에 모여앉아 라디오 하나에 귀를 쫑긋하며 소설 드라마를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라디오는 세상과 소통하는 일상의 친구였다. 사람들은 매체로서 라디오를 신뢰했다. 미디어가 귀해서였을까.

톡톡지역문화연구소장·언론학 박사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