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몇 가지의 직업을 갖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직업을 거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고 직업의 주기는 짧아지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모든 밥벌이는 나름의 고충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일터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애환은 특수하게 보이지만 실은 매우 보편적인 사회성을 띠기도 합니다. 전문 직업인이 직접 쓴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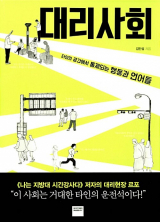
◆ 대리운전 기사가 쓴 르포 문학, 대리사회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는 요정이 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대신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 주는 요정이 있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김민섭의 '대리사회'(김민섭 지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작가는 생계를 위해 직접 대리운전을 하면서 경험한 인간 군상을 그립니다. 타인의 운전석이라는 가장 좁은 공간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대리기사는 세 가지의 '통제'를 경험한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통제입니다. 액셀, 브레이크, 깜빡이 외에는 차 주인이 맞춰 놓은 대로 최대한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나 백미러, 심지어 에어컨이나 히터, 음악 볼륨 등을 대리기사가 마음대로 조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의 통제입니다. 대리기사는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 않으며 대화의 화제는 차 주인이 정하고 그가 침묵하면 본인도 묵묵히 운전만 하다가 간간이 "네, 맞습니다"라는 대답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통제입니다. 주체적으로 행위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운전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는 대리기사라는 한정된 직업 세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대리사회가 아닌지 반문합니다. 일터에서 또는 삶의 공간에서 남의 차 운전석에 앉은 듯 주체가 되지 못한 적은 없었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법을 점차 잊어가다가 결국에는 사유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사회. 일련의 통제에 익숙해져서 누군가의 대리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묻습니다.
평소 우리가 잘 몰랐던 직업의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히는 가운데 묵직한 주제가 깔려있어 통찰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타인을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어른들로 인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갈 사회는 지금보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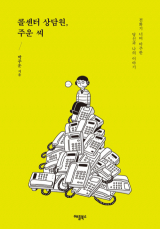
◆ 상담원은 기계가 아닌 사람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콜센터에서 5년간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 '콜센터 상담원, 주운 씨'(박주운 지음)가 있습니다. 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감정노동자로서 상담원의 일이 얼마나 고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은 상담원들의 근무 환경, 직업적 특징, 상담원의 직업병과 진상 고객들의 유형, 콜센터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상담원들은 고객에게 맞춰 응대를 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과 마음은 숨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민원 고객, 진상 고객을 대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동요되지만 좋은 감정만 드러내야 합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고객들도 평소보다 과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밥벌이들이 토로하는 직업적 고민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기면서 비단 그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직업이 가진 특수성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읽다보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예매해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나도 사람입니다"라는 두 문장으로 좁혀지는 듯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겨야 하는 상담원이지만 감정 없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도 이 사회에 속한 인간이기에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마음까지 내려놓을 순 없지 않을까요?
이 책 가운데 큰 웃음을 주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상담원들은 전화 예매 시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의 성함을 한 글자씩 단어에 빗대어 확인합니다. 고객의 이름이 '○○걸'이었는데, 처음 두 글자는 제대로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 '걸'자가 계속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겨우 생각한 게 하필 '걸레'였는데 차마 걸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고객이 "네! 걸레할 때 걸이요!"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소개돼 있습니다. 힘든 일상 가운데 웃음 포인트가 하나씩 섞여있는 우리네 삶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구시교육청 학부모독서문화지원교사모임(박미진)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