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이다. 양국 무역 규모는 3천15억4천100만 달러,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2021년 기준) 하지만 지난 30년과 달리 한-중 미래 전망은 어둡고 불안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호 존중'이 한중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자 기조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동맹' 참여 등은 그 원칙의 일환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교민 사회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가령, 국익을 위해 사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 중국의 반발을 상쇄할 반대 카드도 내보여야 하는데, 그런 기미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굴종 외교'였다는 인식 아래 전 정권과 '반대의 길'을 표방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인접국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와 인권 무시, 사드 배치에 적반하장식 간섭 등 갈등거리가 많은 나라다. 미국이나 일본과는 성격이 다른 나라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현실적인 국가'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그와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이 그렇듯, 우리 역시 국익 우선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니 '안미경세'(安美經世)니 하는 말도 필요 없다.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을 펴고, 그것은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기'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략적 모호'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묻는 중국과 미국의 압력도 줄일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보복에 대한 방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국가일수록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국가로 전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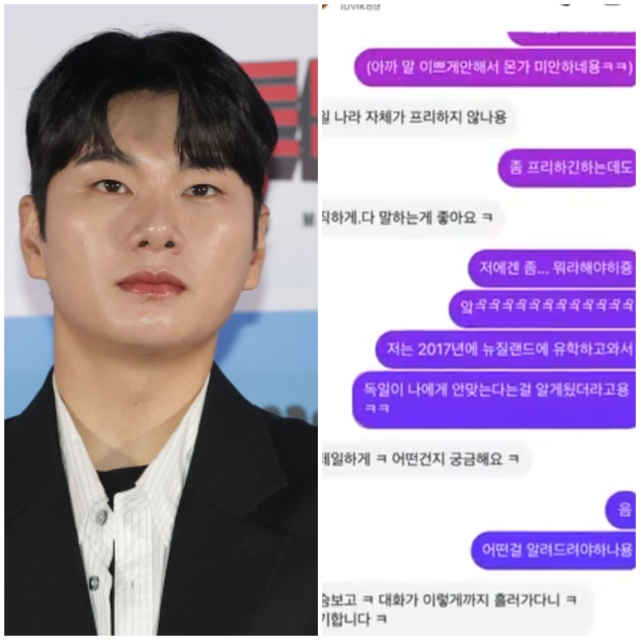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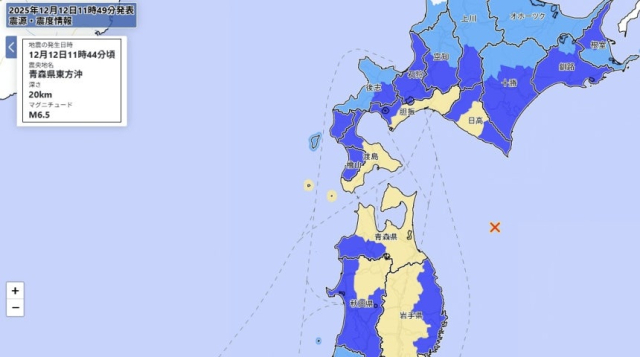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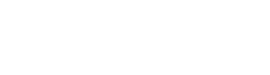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