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게에서 저녁에 일하는 학생이 그만둔다. 2학기 수업이 모두 낮으로 잡혔다. 새로 일할 사람이 다녀갔다. 나는 새 사람 얼굴을 보지 못했다. 곁님이 이력서를 보냈다. 빽빽하게 적혔다. 어떤 사람일지, 일을 오래 할지, 일을 잘할지 훑어본다.
여느 이력서와 다르다. 꼼꼼하게 적었다. 학력을 보니 여상을 나왔고 마흔 넘어 대학공부를 하고 사이버대에서도 배웠네. 자격증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아동심리상담사, 부모교육상담사, 전산회계를 땄다. 열세 해를 은행에서 일하고 열여섯 해를 쉬었다가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막창집에서 주말 곁일을 했다. 여기까지야 누구나 이야기를 하지만 집안 이야기는 좀처럼 잘 안 하더라. 그렇지만 이분은 스스럼없이 적었다. 이분 곁님도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마쳤고 아이들이 다니는 일터도 적었다.
나를 돌아본다. 나는 열한 해 앞서만 해도 이력서를 자주 냈고, 우리 집안 이야기는 감쪽같이 숨겼다. 말도 아꼈다. 내가 하는 일을 말하면 월급이 드러날까 싶어 부끄러웠다. 일터를 말하면 얼마나 배웠는지도 드러나고 돈벌이가 드러난다. 우리 집 살림을 다 드러내는 일이 아주 싫었다. 누구네처럼 달삯이 많으면 떠벌리고 다녔을지 모르나, 마흔 살이 넘어 새로 얻는 일터에서는 내 벌이도 시원찮고 이때 곁님 일터는 몇 군데가 줄고 붙고 어지러운 판이라, 이 일자리를 지켜낼지 밀려날지, 줄어든 벌이처럼 졸아든 마음으로 어깨를 움츠렸다.
우리 가게에서 하는 일은 자격증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된다. 학생이나 아줌마나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는다. 학생은 처음 일하는 사람이 많고 아줌마는 한두 번쯤은 일을 해 본 사람이다. 나이 쉰 넘으면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거듭하는 일인데도 처음 하는 듯 버벅거린다.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다. 돈을 만지고, 물건이 돈이다. 마음을 바짝 써야 돈도 틀리지 않고 물건도 잃지 않는다. 무엇보다 오래 일하지 못한다.
처음 우리가 이 일을 맡아 할 적에는 우리가 해 왔던 일처럼 일꾼한테 깍듯이 했다. 물건을 넣는 사람한테도 깍듯하게 했다. 열 해 앞서만 해도 이들(가게 일꾼이나 배달기사)을 깍듯이 여기는 사람이 드물었다. 위아래가 뚜렷했다. 그때나 이제나 우리는 우리가 받고 했듯이 일꾼을 맞았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스무 해나 넣지만, 우리처럼 깍듯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분들 일을 다들 하찮게 여긴단다. 내가 사람을 옆에 두고서 일을 해보아도, 사람을 부려 보아도 우리 일도 똑똑한 사람이 들어와야 하나라도 낫다.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력서만 보고도 느낌이 온다. 이분 첫 일터가 은행이었으면 돈도 잘 다루고 꼼꼼하겠지.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씨도 몸에 익었을 테고, 어쩐지 나긋나긋 상냥해 보인다. 어질게 일을 맡아 하리라고 헤아려 본다.
얼굴을 보지 않아도 글로 만나지 않아도 이력서 한 쪽에 한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남는구나. 첫 일을 그만두고도 끊임없이 무언가 배우려고 애썼다는 대목도 이분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말해 주는 듯하다. 내가 젊은 날 은행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꼭 내가 쓴 이력서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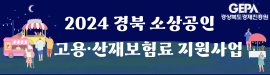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