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동창이 운동회 얘기를 꺼낸 것은, 지난 주말 본가에서 그 일이 화제에 오른 게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모처럼 모인 다섯 남매는 평상에 둘러앉아 삶은 감자와 유년의 기억들을 나누었다. "쟤, 빤스 입고 뛰었던 거 기억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보다 두 살 많은 형이 말했다. 와- 모두 생각난 듯 손뼉을 치며 일제히 웃었다.
40여 년 전의 학교는 어디든 또래 아이들로 복작거렸고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달리기 순서는 다가오는데 동창에게는 체육복이 없었다. 엄마에게 몇 번이나 운동복을 사야 한다고 말했는데, 어쩐 일인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구들 틈에 숨어있던 그를 선생님이 찾아내 출발선에 세웠다. 바지 속을 들춰본 담임은 백군이니 마침 잘됐다고 했다. 전교생과 전교생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은 흰 삼각 빤스를 입고 달렸다.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이 동화처럼 펼쳐진 날이었다. 머리 위 만국기가 속절없이 펄럭였다.
"부끄러워서 빨리 뛰었더니 1등이더라"는 동창의 너스레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폭소를 터뜨렸다. 모두를 웃기면서, 그는 웃지 않았다. 나는 이 이야기가 두 번째인데, 같이 대학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나도 박장대소를 하며 웃었다. 그러나 열 살의 남자아이를 키워 본 지금은, 전혀 웃기지 않았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쓴 김지혜 교수는, 이런 언어 공격은 내면에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반면 그 말이 왜 문제인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순간은 짧아서, 대개 말문이 막힌 채 그 찰나가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웃는가?'라는 질문만큼 '누가 웃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형이 동생을 비하하고 자신이 우월해지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저 가족이 공유하는 옛 기억 하나를 소환해 한바탕 웃자고 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웃자고 한 이야기에 죽자고 덤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부모님 밑에서 같은 학교 5학년이었던 자신은 어떻게 싱그러운 녹색 체육복을 단정히 입고 등교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도 형보다 자신이 먼저이길 아니, 최소한 동등한 대우라도 받아보는 것이 동생의 아픈 바람이라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데 말이야, 동창이 말을 이어갔지만 사람들은 이제 저마다의 수다에 빠져 듣는 이가 없었다. 방에 계시던 모친이 밖으로 나와 자식들이 웃는 이유에 대해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구나."
형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 모를 수 있다고, 자식 다섯을 키우며 농사까지 짓던 엄마야 말해 뭐하겠냐고, 그게 무엇이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있던 동창은 힘이 쭉 빠졌다.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안 순간, 비록 그때가 언제이더라도 사과해야 한다. 그 사과는 진심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잘못한 이가 없으니, 그가 먹은 마음은 처음부터 쓸데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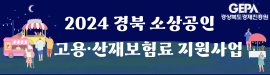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