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은 여기에 있는데 단숨에 마음을 이탈시키는 것들이 있다. 니나 시몬의 음악이나 사데크 헤다야트의 소설은 나를 곧장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회전목마에서 손 흔드는 아이나 막 떠오르는 태양은 즉각 삶의 의지를 끌어올린다. 어제 딸이 '부천'이라는 지명을 통화 중에 꺼냈을 때 그랬다. 발화와 동시에, 부천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보았다.
딸아이가 열여섯 중3이던 시절, 사춘기가 절정이었다. 짜증 내고 말대꾸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침잠하자 슬그머니 겁이 났다.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딸은 부천에 가고 싶다고 했다. 뭘 사달라거나 친구와 놀고 싶다는 답을 예상했던 나는 조금 당황했다.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만 보고 싶어요."
부천터미널의 이름은 '소풍'이었다. 터미널에 이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지만 '소풍'이라니, 제대로 낭만이었다. 우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곳 가까이에 숙소를 잡았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오직 영화만 봤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다르지 않았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극장에서 살았다. 그나마 세끼를 다 챙기지도 못했다. 모든 영화를 딸이 골랐고, 깜짝 놀랄 만큼 좋았다. 그것은 딸이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는 깨달음이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지도 위에 위치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가지는 유토피아들이 있다고 했다. 또 고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시간을 가지는 유토피아적 시간들이 모든 사회에 있다는 것이다. 모든 장소에 맞서서 그것들을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 시키는 반反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독특한 시간의 분할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내가 자란 집은 동성로와 가까웠다. 나는 산책하듯 시내로 나가 영화를 봤다. 멀티 상영관도 없고, 혼자 영화 보는 사람도 드물 때였다. 한일과 아카데미, 송죽과 자유극장을 순례하며 여러 편의 영화를 종일 보았다. 어떤 날은 제일과 아세아, 국제와 만경관이었다. 그렇게 내 안의 소란을 견뎠다. 그러고는 다시, 어두운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천의 극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나'라는 물질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한 경로를 통해 딸에게 흐르는 것은 아닐까. 시대 없는 시간이 파도처럼 넘실대며 아이에게 깃드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리하여 딸과 나는 장소 아닌 장소, 몸 아닌 몸으로 여기 나란히 앉아 낄낄대며 '스위스 아미 맨'을 보는 것이라고 말이다.
수화기 너머 딸이 말했다. "그때 부천에서 봤던 영화, 그 감독 신작이야. 꼭 봐요." 도무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제목과 어지러운 포스터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멀티버스를 소재로 온갖 병맛과 화장실 유머를 섞어 액션과 SF로 무장한 영화였다. 그러나 롤러코스터 같던 영화가 막바지를 향할수록, 나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다. 나 외에 유일한 관객인 앞줄 아가씨는 연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딸이 왜 그 영화를 추천했는지 알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특히 엄마는 딸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이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쩌면 그래서 그 상처는 더 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모든 모녀의 기묘하고 이상한 제국을 믿는다. 그들이 건설한 나라의 불멸을 자부한다. 왜냐하면 서로 안의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그 나라의 '국룰'이고, 사랑 아닌 것들은 언제나 열등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영화는 입소문을 타고 흥행 중이라고 한다. 뭘 해도 조금은 쓸쓸한 이 계절은, 잊고 있던 유토피아를 찾아 나서기에 제격인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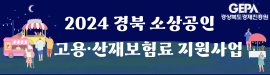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