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이 사흘간 제주도 애월에 다녀오겠다나. 나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얼굴로 배웅하고선 돌아서서 입을 벙싯거리며 현관문을 단단히 걸었다. 이 명랑한 머릿속.
저녁이 되자 자유를 누릴 그녀들이 단단한 현관문으로 들었다. 우린 30여 년 전 윗집과 옆집과 아랫집으로 만난 인연이다.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남주는 한결같이 위층에 살고 정봉은 도시의 외곽이 그리워 강의 안쪽으로 이사 갔다. 그렇게 셋이 원주민이 된 집에서 맨발로 만났으니 오죽할까. 걸핏하면 정전되던 옛날처럼 부러 불을 껐다. 마시던 맥주캔을 머리맡에 밀쳐 놓고 몸 가는 대로 눕는다. 한참 기척 없다 싶으면 코 고는 소리. 오래된 집의 창문 소리에 목소리 건너오고 다시 맥주 거품 일 듯 사그라드는 대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혼자다. 마저 남은 자유를 어디에 쓸까.
새벽 3시. 이미 잠은 줄행랑을 쳤다. 뜬금없다는 말. 무언가에 홀린 듯 방방이 다니며 볼펜꽂이 통을 한곳에 그러모은다. 순식간에 100여 자루가 넘는 필기구들이 쏟아진다. 문구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늘 두어 자루씩 사 모은 게 화근이었다. 자연스레 신구(新舊)가 뒤섞여 한통속을 이룬지 오래다. 볼펜의 평균 수명이 2여 년이라는데 십수 년을 방치했으니. 언제나 흔적은 내재되어 있던 시간을 끌어와 재구성하는 모양이다. 홍보기념품, 답례품, 여행지에서의 선물. 어느 종족에서 건너왔는지도 모를.
가짜 몽블랑. 부러지고 볼 빠지고 두어 방울 남은 대롱 속 액체. 몽당연필. 제 색을 내지 못하는 형광펜. 스프링 헐거워진 것들을 골라냈다. 첫 저서에 사인했던 붓펜은 굳었다. 볼이 회전하면서 흘러나온 잉크 일부는 툭툭 치니 숙변을 쏟아냈다. 일명 '볼펜똥' 이다. 볼펜은 펜 끝에 장치된 자그마한 공 모양의 금속 볼을 끊임없이 회전시키고 연필은 칼날에 자기 몸을 맡겨 글자를 만든다. 더는 칼질할 몸과 회전되지 못한 볼이 무언가를 생산해 내지 못할 때 비로소 이들은 죽은 자가 아닐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고 나니 손목이 얼얼하다. 그럼에도 촉촉한 글씨를 내뿜는 펜을 발견하는 일은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심판대로 사용되었던 이면지의 한 공간에 무심코 적어 내려간 글자 행렬. '아주 오래된 내 친구들 잘 돌아갔을까. 지금 애월의 새벽은 나의 자유보다 달콤한가?' 참 먼길을 돌아왔단 생각 들지만, 모든 것은 늘 곁에서 앓는 소리를 냈는지도 모를 일이지. 앓는 소리에 잠들지 못한 채 오롯이 펜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쓰는 일. 따습기도 하더라는 거.
액체가 고체로 굳어가는 동안 한 여자는 그저 어느 변방과 도시의 경계를 잇는 다리 위에서 강물을 바라보곤 한다. 때론 어느 외곽에서 젖무덤으로 말랑말랑하게 살고 싶었고 때론 한방을 기대하며 살고 싶었다. 상관없는 껍데기 따위에는 왜 그리 흔들렸는지. 소위 잘나가는 사람들.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돈 벌 재간도 없는 나를 보며 빈 대공을 채워 줄 차가운 피를 갈구했다. 그럴 때마다 펜대를 굴리고 자판을 두드렸다. 돌이켜 보면 그것은 내게 일종의 약이었지만 여전히 펜이 주는 비옥하고 무한한 약의 베일을 까발리지는 못했다. 어정쩡하게 흘러나온 글자들은 밤 고양이처럼 뒷골목의 담벼락에만 걸터 있었다. 실은 대로변이 그리웠고 볕이 그리웠다고.
이번엔 틀림없이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 줄 펜의 함성을 믿어볼 수밖에. 천천히 발등을 오므리고선 베란다에 섰다. 잿빛 블라인드 사이로 젖은 눈 날린다. 여전히 명랑한 머릿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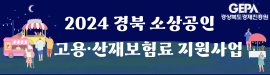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