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걸하는 여인이 있다. 여인은 지하철 출입구 부근에서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한다. 그녀는 점심나절 나타났다가 해 질 무렵이면 사라지는데 구걸 행위가 독특하다. 그녀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외친다.
"아저씨요! 오백 원만.",
"아줌마요! 오백 원만."
신분에 걸맞은 호칭을 구사하면서 더도 덜도 말고 딱 오백 원만 달란다. 재미있는 것은 아저씨나 아줌마를 부를 때는 톤이 올라가는데 '오백 원만'에서는 슬며시 내려간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낭랑한지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녀는 땟국이 흐르는 맨발에다 엉덩이가 치맛자락 밖으로 삐져나왔다. 제 몸도 하나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육중한 몸집을 끌면서 영락없는 거지 행색으로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있다. 한겨울의 추운 날을 빼고는 늘 같은 장소에서 구걸한다. 가끔은 시간대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으나, 이동 거리라야 고작 지하철 출구를 거점으로 백여 미터 전후가 전부다. 버스 주차장이나 횡단보도 앞, 사람들이 붐비는 주변을 벗어나는 법이 거의 없다. 그러니 사람들 눈에 항시 잘 띈다.
그녀를 그 장소에서 본 지도 벌써 3년째 접어들었다. 내가 이곳으로 이사 오고부터 계속 보아왔으니 그런 셈이다. 언제부터 그 장소에서 구걸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혹여나 그 옆을 지나치다가 "아저씨요!" "아줌마요!"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은 되레 안부가 궁금해지기까지 하니 참 별일이다.
그녀가 그 주변을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이유가 뭘까? 무슨 곡진한 사연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발동하기도 한다.
그녀의 나이는 일흔을 조금 넘긴듯하나 그것도 추측일 뿐 정확한 나이는 모른다. 다만 목소리는 사십 대라 해도 믿을 만큼 젊고 힘이 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도 '아저씨요! 오백 원만'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허구한 날 똑같은 톤으로 외치다 보니 연습이 된 것인지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오백 원 동전 앞면에 그려진 학이 그처럼 울었을까? 아마도 그녀는 소싯적에 잘나가던 가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이르자 절로 웃음이 나온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자들이 구걸하는 그녀를 보면서 한마디 한다. 집도 있고 서방도 있는 여자가 저러고 있다고. 그러고 보니 그녀는 아저씨요! 아줌마요! 누구를 부를 때는 생기가 돌았으나 오백 원만을 외칠 때는 사뭇 달랐다. 구걸에 대한 절박감이나 절절함이 묻어나지 않았다. 구걸 행위는 단지 사람 냄새가 그리워 그냥 하는 그녀만의 놀이와도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그런 그녀가 나에게 또 다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생겼다. 그녀의 패션이 가끔 바뀐다는 점이다. 손으로 직접 짠 듯한 수를 놓은 벙거지를 생뚱맞게 쓰고 있는데 그 모양새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다. 때가 꾀죄죄하게 묻어있는 옷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더러운 옷은 동냥의 수단이기에 어쩔 수 없다지만, 모자만큼은 한껏 멋을 부려야겠다는 여자의 본능적인 심사가 작용한 것일까. 오백 원 동전의 학처럼 훌훌 날고 싶은 충동을 모자로나마 보상받으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녀와 맞닥뜨릴 때는 나 역시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다. 동전이 없는 날은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손에 쥐여 주는데 그걸 뺏다시피 낚아채서는 치마 속으로 쑤셔서 넣는다. 손아귀 힘이 무척 세다. 그런 행동으로 봐서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나, 자신의 어쭙잖은 행동에 민망해할 때는 살포시 눈웃음을 짓는다.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는 여인이 아닐 수 없다.
한번은 구걸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이면도로 골목 안이었다. 그녀는 막 뜯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빵을 한입 물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보물단지처럼 항시 떨어지지 않던 보따리가 옆에 펼쳐져 있었다. 신문, 빨간색 지갑, 보온병 등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열린 지갑에서 햇빛에 반사된 동전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했다.
순간, 오백 원 동전의 학이 날갯죽지를 푸드덕거리며 땅을 박차고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환영이 보였다. 동냥 사이사이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타임을 즐기며, 구걸한 돈을 지갑에 챙겨 넣으면서 마냥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돈이 없으면 자유를 잃는다고 했던가.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았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 자유'라는 명언을 남겼다. 돈의 위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말이다. 저 여인 역시 말 못 할 아픔이나 사연을 가슴에 안고 살다 보니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것은 아닌지.
도심 속에는 각기 다른 다양한 개체들이 옹기종기 모여 조화를 이루면서 어울려 살아간다. 그녀 역시 이제는 이웃으로 다가와서 우리들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스로 터득한 길거리 철학을 깨우친 듯하다. 오늘도 "오백 원!"하는 그녀의 경쾌한 목소리에 동전에 새겨진 학이 날아오르는 환영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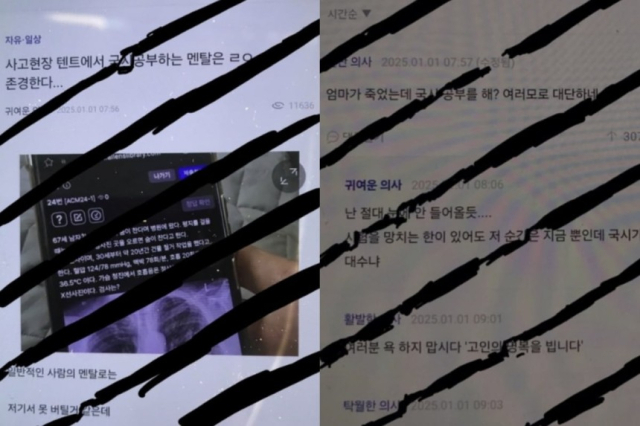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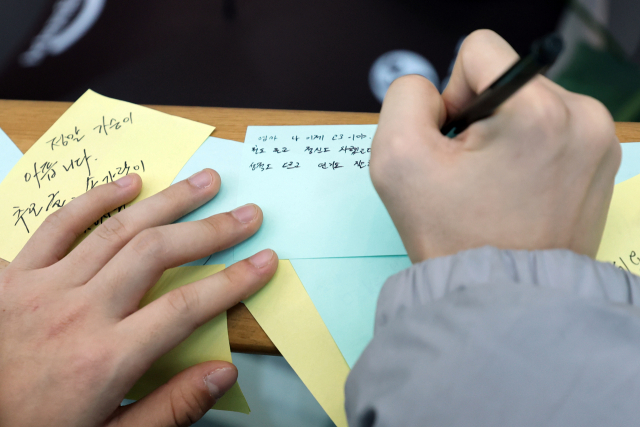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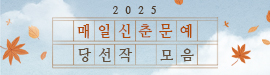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다시 보이네 와"…참사 후 커뮤니티 도배된 글 논란
"헌법재판관,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반발에…눈시울 붉힌 최상목
임영웅 "고심 끝 콘서트 진행"…김장훈·이승철·조용필, 공연 취소
음모설·가짜뉴스, 野 '펌프질'…朴·尹 탄핵 공통·차이점은?
이재명 신년사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 삶…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