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형질이 없는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글과 말은 존재한다. 세상을 바꿀 만한 멋진 생각이라도 글과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 글과 말은 생각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구인 셈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도구의 쓰임은 참으로 다르다. 수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존'과 '전달'이라는 각각의 대표적 특성이 이 쓰임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녹음이나 녹화 같은 보존적 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 말은 내뱉으면 이미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아마 말이 주워 담을 수 있는 실체를 남긴다면 세상의 수많은 송사(訟事)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글은 주워 담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떤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 말에 비해 표현 방식의 다양함은 떨어지는 반면 규칙이 대단히 엄격하다. 일단 글은 배워야 한다. 말처럼 성장하면서 터득할 수가 없다. 글자만 안다고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법(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글 앞에서 겸손해진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세상을 살다보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조직을 만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쓴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가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신도 상대방도 그 가면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할 수 없는 '독자'라는 상대를 만나야 하는 글 앞에서 가면은 더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보통의 경우, 인간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글 중 최초로 시도하는 것은 일기일 것이다. 물론 일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장르적 반경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가면을 쓸 필요가 없지만 가끔 그 일기가 공개되는 순간도 있다. 일기 속에서 만나게 되는 실패와 분노, 사랑과 질투, 성공과 보람 같은 일상적 삶의 기록은 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는다. 문장의 수준이나 표현의 세련됨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일기의 가치를 폄훼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기가 가진 '글의 소박함' 때문이다. 내용이 소박한 것이 아니라 집필 방식 자체의 소박함이다.
감정이나 상황을 소박하게 만들면서 자신을 높여 보겠다는 포석은 글 속에서 그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에세이나 SNS에 기재하는 글은 더욱 그렇다. 허술한 작전으로 만들어진 엉성한 글은 도리어 독자의 비아냥거림만 살 뿐이다. 성실히 노력해서 큰 재산을 일구고 지금 수십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욕할 이유는 없다. 또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삶 자체는 그대로 글로 옮겨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굳이 소박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나의 성공을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나는 이것을 이만큼 가졌다'라고 소박하게 써낼 자신이 없다면 혹은 그것을 올곧게 '못 쓸 이유'가 있다면 그런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글은 말보다 훨씬 오래 남고 또 어디서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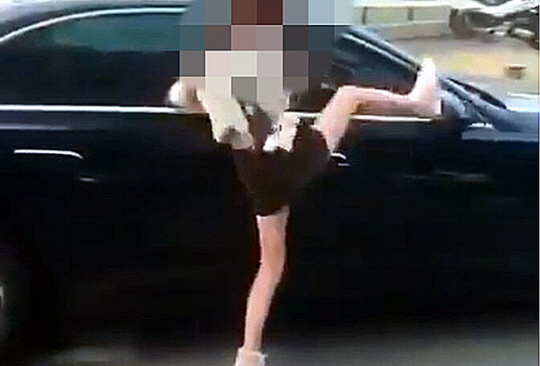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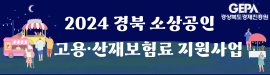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
"삼성 입사했는데 샤오미된 꼴"…동덕여대 재학생 인터뷰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