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의 이치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진실한 사람들은 요절하거나 굶어서 죽고, 큰 도둑은 천수를 누린 역사에 의문을 품고, 사마천은 울분을 터뜨렸다. 오늘날, 변한 건 없다.
최근 빛을 에너지로 전환해 활동하는 세균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접하며, 인간도 빛에서 생명을 얻는 존재임을 생각해본다. 한없는 빛의 존재를 믿으며, 인간은 혼돈과 불안을 가로질러 왔다.
"파수꾼아,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면 무엇하랴! 밤이 또 오는데…"『구약성서』「이사야서」의 이 구절을 대할 땐 좀 먹먹해진다. 깜깜한 밤, 여명을 기다리는 세상의 숱한 파수꾼들이 안쓰럽기 때문이다. 살아갈수록 이 땅 위엔 왜 빛보다 어둠이 갑처럼 느껴질까.
밤하늘을 쳐다보며 깜깜한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한두 번쯤 읊었을 것이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헝가리 출신 철학자 루카치의 말이다. 경비행기에 우편물을 싣고 아르헨티나로 처음 야간 비행을 떠난 날, 생텍쥐페리는 칠흑의 어둠 속에서 지상의 평야에 드문드문 흩어진, 별처럼 반짝이던 불빛을 본다.
그것을 그는 "의식이라는 기적"이라 했다. 인간의 생각은 감사해야 할 불빛. 『대학』에서는 하늘이 준 빗살무늬로, '밝은 덕성[明德]'이라 했다.
빛은 희망이자 선(善), 문명이고 진리, 질서와 지혜와 삶을 상징한다. 낮에는 태양을 쳐다보고, 밤에는 달과 별을 쳐다보며, 삶을 토닥인다. 집에 들어와서는 등불이나 촛불로 어둠을 밝힌다. 빛에 대해 어둠은 절망이자 악, 야만과 거짓, 혼돈과 무지와 죽음을 상징한다.
베르메르의 그림 '델프트의 조망'에서는 빛이 들어 노랗게 빛나는 벽면이 압권이다. "나도 글을 저렇게 썼어야 했는데…노란 벽의 작은 자락처럼…." 이 말을 내뱉으며 거기에 손을 대려다 숨을 거두는 소설가 베르고뜨.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이 한 대목에서 인간은 빛을 찾다가 빛 앞에서 죽는 존재임을 떠올린다. 어둠을 배경으로 촛불을 든 노파가, 진지하나 앳되면서 좀 들뜬 얼굴의 소년에게 불을 붙여주는 루벤스의 그림 '촛불을 든 노파와 소년'도 그렇다. 일등(一燈)이 천등, 만등이 되는 전등 설화처럼 어둠에서 빛을 전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 아닌가. 동서양 어디에나 길을 밝힐 빛을 갈구해왔다.
중국 송대, 어느 지방 역사 담벼락에 누군가 적었다는 낙서가 있다. "하늘이 공자를 낳지 않았더라면, 온 세상이 아주 오랜 세월 깜깜한 긴 밤 속에 있었으리라." 이땐 공자가 등불이었다. 유교의 약발이 다해가는 지금 다시 이런 글이 적힐 리 없겠으나, 어쨌든 빛과 어둠은 인간세계의 두 축이다.
그래서 아예 "결국 이 지상에 남는 것은 빛과 어둠이다"라고 간명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다. 폐허의 철학자 에밀 시오랑이다. 죽음, 슬픔, 절망, 무의미에 대해 적은 그의 책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에서는, 빛보다 어둠이 주인이다.더 나아가, 어둠에 더 들어선 사람도 있다. 구조주의자 레비 스트로스다. 그는 『슬픈 열대』에서 "세계는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또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
사실 인간의 내면은 어둡다. 이기심, 욕망은 세상이 망하든 말든 자신만 살면 된다고 부추긴다. "나는 병적인 인간이다…온 세계가 파멸해버린대도 상관없지만, 나는 언제나 차를 마시고 싶을 때 마셔야 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생활자의 수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딱히 부정하고 싶진 않다. 어리석음의 신, '우신(愚神)'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예찬한 에라스무스라면 당연 두 손 들고 지지할 것이다.
어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 또 있다. 중국 고대의 사상가 장자이다. 그는 빛-문명과 거리가 먼 '어둠'에 발을 디디고 있다. 어둠은 '혼돈, 무, 자연'의 다른 말이다. 어두운 땅 '몽(蒙)' 출신인 그는 칠흑을 낳는 '옻' 밭 관리인이기도 했다.
니체 또한 어둠에 대해 동경한다.『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는 말한다. "아, 내가 캄캄하다면, 칠흑 같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나 얼마나 열심히 빛의 젖가슴에 매달려 빛을 빨려 했겠는가!" 어두울수록 빛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어둠 앞의 빛 한 줄기는 얼마나 연약한가. 혼돈-무분별 앞에서 질서-분별은 또 얼마나 깐족대는가.
이쯤에 『무문관』의 이야기에 들어서자. 덕산이 용담에게 가르침을 청해, 마주하다 보니 밤이 깊었다. "밤도 깊었는데 이제 가 봐야지" 용담이 말하자, 덕산은 인사를 하고 주렴을 걷었다. 밖이 칠흑. 고개를 돌려 "깜깜한데요"라 하자, 용담이 지촉(紙燭)에 불을 붙여 건넸다. 덕산이 받으려 하자 용담이 훅 불어 꺼버렸다.
이때 덕산은 홀연히 깨달았다. 이튿날 덕산은 애지중지하던 경전을 법당 안에 쌓아 놓고 불 질러버렸다. 불빛-분별에 쏟을 에너지를 줄이면, 거기 기생하던 지혜는 무릎을 꿇고, 어둠-무분별로 향할 힘이 축적될 것이다. 유일신 같은 빛에 대항하여 "태양을 꺼라!", "빛을 누그러뜨려 티끌과 같아져라!", "외부로 향하는 빛을 내부에 감추어라!"한 것은 모두 빛의 폭력, 간계를 경계한 말이다.
에셔가 그린 '천국과 지옥'에는 천사와 악마가 붙어있다. 빛과 어둠은 상대가 없으면 곧 소멸한다. 어둠 없인 빛도, 빛 없인 어둠도 없다. "마음의 반쪽은 광장이고/마음의 반쪽은 밀실이다"(이경임, '야누스의 나무들')처럼 빛과 어둠은 공생한다. 한편, 놓쳐선 안 될 것이 있다! 밤과 낮 사이의 '새벽'이다.
사라져가는 어둠과 다가오는 빛, 그 어느 쪽도 아닌 곳. 원효는 "하나[一]도 지키지 말라" 했다. 거기서 둘[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가 호를 새부(塞部. 새벽)나 원효(元曉, 첫 새벽)로 한 것은 어둠과 빛의 양극단을 넘어서려는 믿음 때문이었으리라.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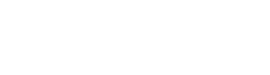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