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공 뫼르소의 이방성은 인간적 관심과 가치에 지극히 무감한데서 나온다. 먼저 어머니로 대변되는 혈육의 도리에 대해서 그렇다. 어머니의 부고를 봤으면서도 "오늘,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양로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잠만 잔다. 장례식 동안 눈시울 한번 붉히지 않으면서 수위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맛있게 마신다.
애인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 뫼르소는 장례식 다음 날 마리와 해수욕을 하고 집에 와 섹스를 한다. 마리가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지만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 며칠 뒤에 또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묻자 "원한다면 할 수 있지만 의미 없는 일"이라고 대꾸한다. 다른 여자에게도 그럴 거냐고 묻자 "물론"이라고 답한다. 인륜지대사인 사랑과 결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다. 운명도 필연도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그렇다. 한낮의 태양이 뜨겁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방아쇠를 당긴다. 자신의 생명에도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자신을 살리려는 변호사를 귀찮아하고 영혼을 구하겠다는 신부를 완강히 거부한다. 이렇게 뫼르소는 그간 인류가 구축해 놓은 인간적 가치, 즉 휴머니즘에 무감하고 무심하다. 진정한 이방인이다.
왜 저렇게 된 걸까? 카뮈가 보기에 서구 휴머니즘은 철저히 파산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도 도덕·윤리·학문·종교와 같은 환영에 기댄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뫼르소는 그런 환영에 등을 돌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이방인이다. 그 결과가 죽음인데도 개의치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의 죽음은 순교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뫼르소는 사형당하기 전날 밤 감옥에서 홀연히 무감과 무심에서 깨어난다.
사인들과 별들(signes et d'étoiles)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나는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심(la tendre indifférence du monde)에 마음을 열었다. 세계가 그렇게도 나와 닮아서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세계(monde)란 정황상 '사인들과 별들'의 세계다. 사인은 '들판에서 들려오는 소리'이고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는 밤의 냄새, 흙의 냄새, 소금의 냄새'를 말한다. 모두 말 없는 자연의 사인이다. 여기에 하늘의 별들이 더해져 '정다운 무심의 세계(monde)'가 열린다. 늘 강요하고 억압하고 개입하는, 유심한 인간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뫼르소는 죽음을 앞두고 이 무심하나 다정한 자연에 마음이 열려 행복을 느낀다. 이 현상은 실상 칸트가 말하는 美의 '무심한 흡족(interesseloses Wohlgefallen)'과 맞닿아 있다. 어떤 대상에서 아무 사심 없이 흡족을 느낀다면 그것은 미적 행복감이다.
무심하나 다정한 자연계에 깊은 형제애를 느낀 순간 뫼르소의 철옹성 같던 이방성은 해체된다. 인간은 그동안 선의란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혹은 신의 이름으로 줄기차게 타인과 타인의 삶에 관심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억압과 폭력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 무심과 무위만 못한 것이었다. 다정한 무심 아니면 무심한 다정, 이것이 카뮈가 <이방인>에서 고안한 새로운 휴머니즘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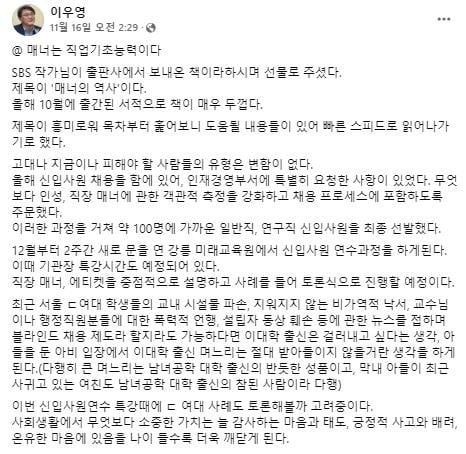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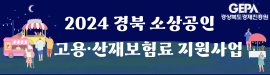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사드 사태…굴중(屈中)·반미(反美) 끝판왕 文정권! [석민의News픽]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이재명 외 대통령 후보 할 인물 없어…무죄 확신" 野 박수현 소신 발언
尹, 상승세 탄 국정지지율 50% 근접… 다시 결집하는 대구경북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