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꽤 오래전에 우연히 들었던 말인데 두고두고 곱씹어지는 말이 있다. "내가 알잖아"라는 말도 그중 하나다. 이효리가 TV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일화다. 남편 이상순과 나무 의자를 만들다가 남편이 보이지도 않는 의자 밑바닥에 사포질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안 보이잖아. 누가 알겠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이상순이 했다는 대답이 "누가 알긴? 내가 알잖아."였다. 어느 누구도 의자 밑바닥을 들여다볼 일은 없을 테니, 불필요하게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이효리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순은 사포질을 멈출 생각이 없다. 내가 아니까.
나만이 아는, 나만이 볼 수 있는, 나만이 기억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사회적 통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규율이 작동하는 영역. 사회화가 기본적으로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에 동의할 때, 그러므로 타자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의 자신의 행동과 규율의 수준은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영역일 땐 단단한 자존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영역일 땐 윤리의 문제로 떠오른다. 이 둘의 공통분모는 내가 나를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 하자.
동료 교수가 권한 책을 읽다가 롱펠로우(Longfellow)의 '건축가들'(The builders)이라는 시가 눈에 띄었다. 일부만 옮기면 다음과 같다.
더 오래전 예술의 시대는
건축가들이 최고의 세심함을 기울여 공들여 만들었지
매순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들이 모든 곳에 계셨으므로.
이 시를 기억해야겠다고 메모를 해 두었던 까닭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모토가 될 시라고 말해서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매순간 최고의 세심함을 기울여 공들여 만드는 자존감 높은 건축가들이 귀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의 건축가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어떤 업무 혹은 일상의 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 더 하는 것이 맞는데 안 한 것,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알잖아'라는 이상순의 말이 이효리에게 가닿은 지점도, 인정의 기준이 타인이 아닌 자기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저렇게 단단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다.
시인 복효근은 그의 시 〈어떤 자랑〉에서 이렇게 읊었다. "소변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 버튼을 누를 사람 몇이나 있을까 생각하자면/ 나에게 소주라도 한잔 사주고 싶은/ 아, 나는 이렇게 나에게 당당한 시간이 있기도 하다."라고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나의 기준에서 내 마음이 시켜서 한 일이라면 이런 '자랑'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이고, 이러한 '내가 알잖아'의 그 윤리적 청량함 또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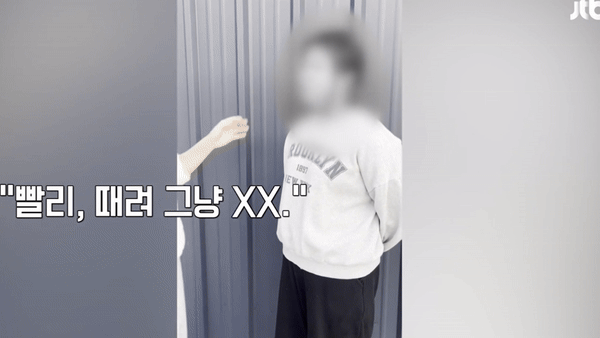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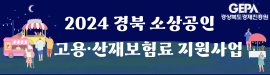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조국 "尹 정권 조기 종식"
尹 회견때 무슨 사과인지 묻는 기자에 대통령실 "무례하다"
스타벅스도 없어졌다…추락하는 구미 구도심 상권 해결방안 없나?
이재명 사면초가 속…'고양이와 뽀뽀' 사진 올린 문재인
"고의로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 1심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