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를 끝으로 2023년도 노벨상 6개 부문 수상자가 모두 발표됐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수상자는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마치 한 단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은 정의(定義)도, 목표도, 경제적 관점에서도 다르다. 과학은 '새로운 지식을 찾거나 창조하는 것'이고, 기술은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수단(도구)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학은 '미래 가치를 위한 장기·간접 투자'에 해당하고, 기술은 '산업 발전을 위한 단기·직접 투자'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은 4.96%로 OECD 국가 중 2위(총액 기준 5위)이다. 일본은 1%를 조금 넘는다. 그럼에도 우리의 '과학기술'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 개발 및 응용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은 과학 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본격 시작된 한국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나라였던 만큼 선진국을 배우고 응용해 쫓아가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추격 국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명과학이든 AI든 가상 세계든 외국의 새로운 지식을 도입해 그대로 따르거나 응용하는 데 집중한다. 과학에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기술에 단기 투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형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대학이 위기'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대학 위기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식의 위기는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대학교수님들의 '일자리 위기'라고 해야 적절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진짜 위기는 오래전에 닥쳤고, 이미 고질(痼疾)이 되다시피 했다. 대한민국이 아직 추격 국가였을 때는 대학들이 역량의 대부분을 기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집중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추격 국가에서 벗어나 선도 국가 문턱에 이르고도 우리나라 대학은 기존 지식을 가르치는 데 머물렀다. 기존 지식 전수와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세상은 날마다 바뀌는데, 여전히 옛 지식을 전수하는 데 집중하니 대학이 '고학력 실업자 양산소'가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고등학생 상당수가 의대로 몰린다. 2012년 이래 10년 동안 서울대를 자퇴한 학생이 1천990명이고 이 중 84.2%가 이공계 학생이었다. 이들 대다수는 의대·약대에 재입학한 것으로 분석된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이들 중에는 의학이나 약학, 생명과학 연구에 헌신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면허를 따서(기존 지식과 기술을 익혀) 빨리, 많이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돈 버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기존에 세상에 풀려 있는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는 숫자 이상으로, 새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인재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과학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얼마를 줘야 할까. 연봉 1억? 3억? 5억? 아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과학 분야로 돌아올 때까지 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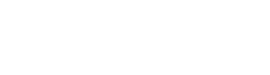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