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6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학생 계약학과 신설, 유학원과 각국 대사관이 연계하는 협업 등이 유치 비책으로 나왔다. 최종 목적은 이들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단순히 유학생 숫자 늘리기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배경이다.
정부도 2027년까지 3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현재(16만7천여 명)의 2배 수준이다. 고등학교도 일찌감치 팔을 걷었다. 전국형 자사고인 김천고가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16명을 받기로 했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등 8개 직업계고도 합류했다. 대한민국이 유학생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해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일본, 대만도 유학생 모시기에 진작부터 나섰다. 유학에서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고 국가 이미지도 제고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초점을 맞춰선 곤란하다는 점이다. 규모를 우선시한 학생 모집에 진력하면 문화 충돌이라는 부작용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어련히 잘 정착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정책적 필패는 자명하다. 유학생이 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함께 온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화려한 금수강산이 그들에게도 통한다고 볼 수 없다. 포용력을 갖춘 문화적 토양이 탄탄한지 자문해 봐야 할 이유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지만 평생의 습성과 관습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유학생 유치에 타협과 포용의 자세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졸업 이후에도 머물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국의 가족과 함께 이 땅에 정착하려 할 때 비로소 유학생 유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지속 가능한 정책이자 개방적 사회의 척도가 될 유학생 유치 과정이 빈틈없이 추진되길 주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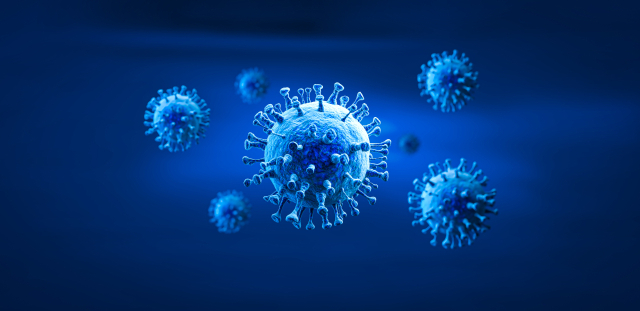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