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했다. 2026년 가동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벌써부터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형 공장 5개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부품·장비 분야 150여 개 업체가 들어선다. 일일 예상 전력량은 7GW로, 1.4GW짜리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5기가 돌아가도 빠듯하다.
SMR은 현재 개발 단계다. SMR이 상용화되지 않거나 가동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경우 피해액은 막대하다. 지난 2021년 미국 텍사스에서 폭염이 발생하자 현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사흘간의 피해액만 4천억원에 달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절반을 사용한다. 2021년 기준 전력 자립도를 보면 수도권은 72%인 반면 경북은 184%에 달한다. 잉여 전력을 수도권에 나눠 줄 수는 있다. 하지만 막대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생산량의 최대 2%에 달하는 누전료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볼 일이다. 송전탑 신설 지역의 갈등 처리 비용까지 더하면 산술 규모는 더욱 불어나, 이 같은 비용을 과연 비수도권이 분담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비용 투입에 있어 일반론은 기반 시설의 설치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가 생기면 그 해소 비용까지 원인 제공자 책임이다 . 다만 예외 조항은 있다. 비용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전력 서비스는 경제 환경이 열악한 지방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처리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여기엔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등 포괄적 내용만 있고, 지역별 전기세 차등화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명시돼 있지 않다. 영호남 시도민들은 님비현상까지 극복하면서 원전 건설을 수용해 왔다. 이들에게 전기세 차등제 주장은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최소한의 현실적 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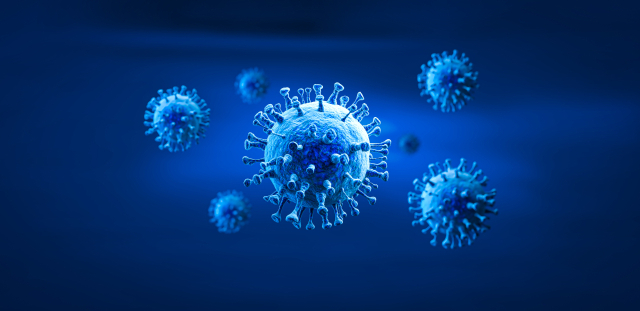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