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 임원, 직원에게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고 한 이건희 회장의 혁신 주문. 삼성은 '신경영' 이념을 도입했고, 글로벌 삼성의 씨앗이 됐다)을 소환하며 고강도 혁신을 강조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좌초 위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인요한 혁신위는 호기 있게 '친윤'을 표방했던 현 지도부 및 핵심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했으나, 성과가 없다. 혁신위는 권고 수준이었던 용퇴론에 대해 공식 의결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기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위 결정의 효력 범위에 선을 긋고 있다. 혁신위는 나아갈 방향도, 존재의 이유도 잃어가고 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정의와 무관하게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기구가 혁신위다. 하지만 혁신위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한다. 혁신적 안을 도출하더라도, 지도부가 수용 불가 판정을 내리면 그만이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하지만 '형식위'에 그치기 일쑤다.
'지도부 험지 출마' 등 국민에게 별스러워 보이지 않는 쇄신안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들갑 떠는 걸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국민이 바라는 진짜 혁신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애초부터 적당히 시늉만 하라는 셈이었는지.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살피기라도 했다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 자산 보유 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띄운 혁신위는 '천안함 자폭' 등 각종 괴담과 막말 전력이 드러나 첫 위원장이 임명 당일 낙마했고, 후임 위원장은 초선 비하, 노인 폄하 등 잦은 설화와 가정사 논란만 빚었다. 동력을 상실한 혁신위가 제안한 대의원제 축소,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 강화 등 혁신안은 유야무야됐다. 당대표에게 종속되고 권한도 없던 혁신위의 예고된 결말이었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칼럼에서 '고인 물의 악취를 가리고 잠시나마 새롭게 단장해 보려는 제스처'를 아웃소싱 정치(혁신위 등)로 정의하며 '스스로 변할 수 없으니 외부 인물을 모셔와 새 단장을 하고 골치 아픈 이슈들을 떠넘기는 것이 담합 체제 정당들이 살아온 방법이다'고 했다.
2005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혁신위'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김상곤 혁신위'는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당시 홍준표 위원장은 당 주류이던 친박(친박근혜)은 아니었지만 당 지도부는 당권과 대권 분리, 국민선거인단 도입 등 혁신안을 수용했고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던 배경이 됐다. 김상곤 혁신위가 내놓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비롯한 혁신안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직을 걸고 통과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듬해 2016년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올라섰다.
두 사례는 정당의 혁신 의지가 강했고, 차기 대선 주자가 힘을 실어 줬으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건희 전 회장은 휴대폰 불량률이 11%에 달하자 수백억원어치 휴대폰을 쌓아 놓고 '화형식'을 하며 최고 제품을 향한 혁신에 사활을 걸었다.
정치권을 향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져 가고 있다. 내년 총선, 바뀌면 이기고 버티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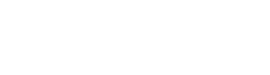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