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이맘때쯤이다. 나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다가 남편의 건강 악화로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셨던 경남 거창으로 이사를 와 살고 있다. 아직도 엄마의 체취가 곳곳에서 느껴진다.
내가 어린 시절 때 엄마는 과일가게를 운영했다. 겨울만 되면 엄마는 저녁마다 내일 파실 귤을 망에다 넣는 작업을 했다. 그게 너무 재미있어 보여 막내딸인 나도 엄마를 졸라 함께 귤을 넣곤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엄마 가게를 그쳐 집으로 갔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갔더니 친구들과 먹으라며 과일을 한 아름 싸줬다. 그런 나를 친구들은 참 부러워했다.
엄마는 내가 결혼 후 처음 친정에 찾아왔을 때 넘어질 듯한 걸음으로 뛰어나와 반겨주셨다. 내 아이가 백일이 되었을 때 옷과 백일 반지를 사 주시며 행복해하셨다. 외할머니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선풍기를 망가뜨려도 혼내기보다는 행여 손주가 다쳤을까 봐 걱정을 하셨다.
그런 엄마에게 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난 아이를 낳고서야 철이 들었다. 엄마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엄마는 20여년 전, 남편과 큰아들을 먼저 보내고 정신을 잃고 몸을 일으키지 못하셨다. 내가 부천에 살 당시 잠시 내려와 엄마를 보살폈다. 그 이후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때마다 정신없어 깜빡하는 당신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파왔다. 하지만 가장 아닌 가장이 되어 투잡을 하며 아픈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지켜내야만 했던 나는 그런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당신을 모시겠다는 내 생각은 그저 생각에 그치고 말았었다. 아! 그때는 왜 몰랐던가. 1년 사이에 남편과 자식을 잃은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를….
점점 시들어가는 듯한 당신의 목소리에 위급함을 느낀 나는 당시 부천의 한방병원으로 모셨지만, 그 또한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고작 일주일 만에 작은 오빠가 살고 계신 부산의 병원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와 큰오빠가 계신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우리 곁을 떠날 때도 난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지 못했다. 그렇게 당신을 보내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먹먹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다.
딸에게 올 때 들고 왔던 가방. 그 가방 속에는 포장지를 뜯지 않은 속옷이 고이 담겨있었다. 지난번 내가 사드린 거였다. 그 속옷을 딸 집에 입으려고 챙겨 오신건지, 아니면 몸이 아파 입을 겨를이 없었던건지….
사람들은 말한다. 집 지을 땅도 있고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 이제는 새장 같은 집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라고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왜 아직도 43㎡(13평)이라는 좁은 이 아파트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내게 이 집은 부모님이고 사랑이고 아픔이다.
철없던 시절의 나. 어리석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나. 손주와 딸이 보고 싶어도 행여 바쁠까 봐, 우리가 힘들까 봐 내색 한 번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하셨던 엄마. 당신의 아픈 삶보다는 나의 힘든 삶만 투덜대며 부모님의 삶을 외면했던 나. 그래서 난 당신이 살고 계셨던 이 터전이라도 부여잡고 당신의 체취를 느끼고 싶어 떠나질 못하고 있다.
하염없이 흐르는 싸구려 눈물이 가슴을 후려치지만 떠나간 당신은 말이 없다. 내 가슴에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 이름 엄마…. 겨울날 차가운 바람처럼 시린 그 이름 엄마….
6~7년 전부터 매년 추석 때만 되면 남편에게 부모님의 산소 벌초만큼은 꼭 우리가 하도록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 생전에 하지 못했던 효도를 지금이라도 해 보고자 하는 작은 마음인걸까. 그리고 산소에 갈 때마다 이야기한다. 철이 없어 죄송했다고.
----------------------------------------------------------------------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매일신문이 함께 나눕니다. '그립습니다'에 유명을 달리하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 밖의 친한 사람들과 있었던 추억들과 그리움, 슬픔을 함께 나누실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전하시면 됩니다.
▷분량 : 200자 원고지 8매,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1~2장
▷문의 전화: 053-251-1580
▷사연 신청 방법
1. http://a.imaeil.com/ev3/Thememory/longletter.html 혹은 매일신문 홈페이지 '매일신문 추모관' 배너 클릭 후 '추모관 신청서' 링크 클릭
2. 이메일 missyou@imaeil.com
3.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매일신문 그립습니다' 검색 후 사연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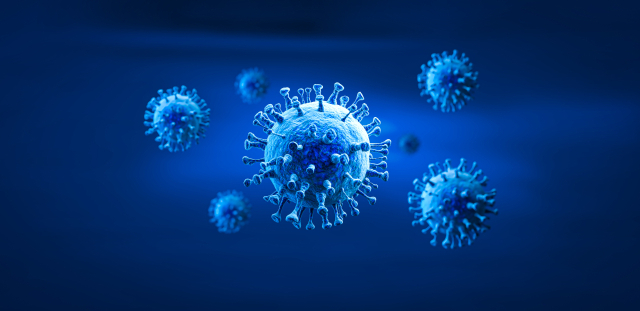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