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식 선생은 대한제국의 장교였다. 망국의 울분을 못 이겨 스스로 죽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한쪽 눈을 잃었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향한 그는 남은 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살다 갔다. 열렬한 공화주의자였으며 '대동단결의 선언'을 주도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철철 넘친다.
여운형 선생은 일찍이 집안의 노비문서를 불태운 선각자였다. 당당하고 훤칠했으며 다재다능한 데다 만능 스포츠맨이기도 했다. 그는 김규식 선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다. 그건 당시로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해방 다음 날 휘문학교 교정에서 연설하는 그의 영상은 늠름한 기상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김규식 선생은 최고의 엘리트였다.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파리 현지에서 사무실을 내고 탁월한 역량으로 맹렬한 외교전을 펼쳤다. 온 겨레의 독립만세운동이 이로 인해 불붙게 되었다. 이렇듯 예관 신규식은 시민의 나라 민주공화국을 제시했고 몽양 여운형은 3·1만세운동을 기획했으며 우사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는 길을 닦았다.
이들은 독립운동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시시로 기억되고 불린다. 기실, 이들 말고도 빛나는 이름의 독립운동가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중국 대륙을 떠돌며, 어떤 이는 총과 칼로 맞섰고 어떤 이는 외교와 교육으로 싸웠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거명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신미년 강화도 광성보의 병사들이다. 미 해군 슐레이 대령이 "나라를 위해 그토록 맹렬히 싸우다 죽은 국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회고한 조선의 백성들이다. 그들은 엄청난 무기와 화력을 가진 적이 짓쳐들어와도 물러서지 않았다. 적군이 끝내 코앞에 닥치자 다 쓴 총을 던지고 구부러진 칼을 던지고 돌과 흙을 던졌다. 그렇게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웠다.
하지만 그토록 용감했던 병사들의 이름은 어느 책,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더러 잊히고 만다. 정미년의 의병도 그렇다.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덕구실 마을, 영국 데일리메일의 기자 프레더릭 매켄지가 촬영한 사진 속 의병의 말이다.
누구의 가족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름 모를 이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다. 그리고 갑오년 우금치에서 죽어간 동학농민군도 마찬가지다. 모두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다. 왕과 지배계급이 나라를 팔아넘겨도 고통과 설움을 참아가며 끝끝내 제자리를 지키고 살아낸 이 땅의 진짜 주인들이다.
혹자는 그건 미련한 거라고, 일본이 페리 제독에게 했던 것처럼 재깍 머리를 숙이고 살길을 도모하는 게 맞지 않았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니다. 그들, 100여 년 전의 우리가 더 굳세었고 더 주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더 의로웠을 뿐이다.
광성보의 병사, 정미년의 의병, 갑오년의 농민군이 있었기에 한국 광복군이 있었고 기미년 강토를 뒤덮은 수백만 '독립만세' 함성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지속이 가능했다. 민주공화국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겐 그 내력이 스며 있다.
그런데 105주년 삼일절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청소년이 가득 모인 곳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인재 육성의 모범 사례로 들었다. 언필칭 '조슈(長州) 5걸(傑)'로, 이토 히로부미를 높여 '분'이라 칭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를 '한반도'라고 했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아닌 그냥 한반도라고 얼버무린 것이다.
그가 공손히 입에 올린 그 이토 히로부미 같은 자들이 세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고 수천만 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 갔다. 그런 자들을 더 키워냈더라면 세상이 얼마나 더 참혹해졌겠는가. 논란이 일자 한동훈 위원장이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또한 틀렸다. 일제가 왕을 신처럼 떠받들며 인간에 반하는 야만과 퇴행을 거듭할 때 우리는 민주와 공화를 외쳤고 인류의 공영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국민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 눈을 맞추려면 자세를 높이고 한참을 위로 올라와야 한다. 지니고 있는 인식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라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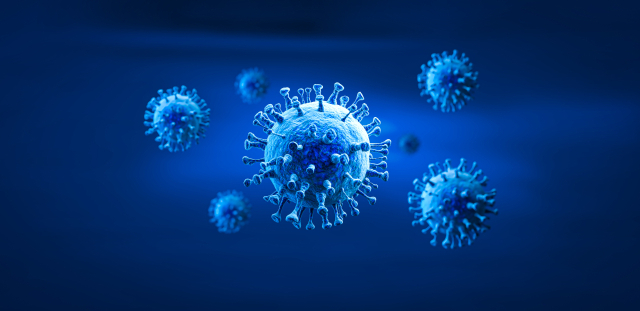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