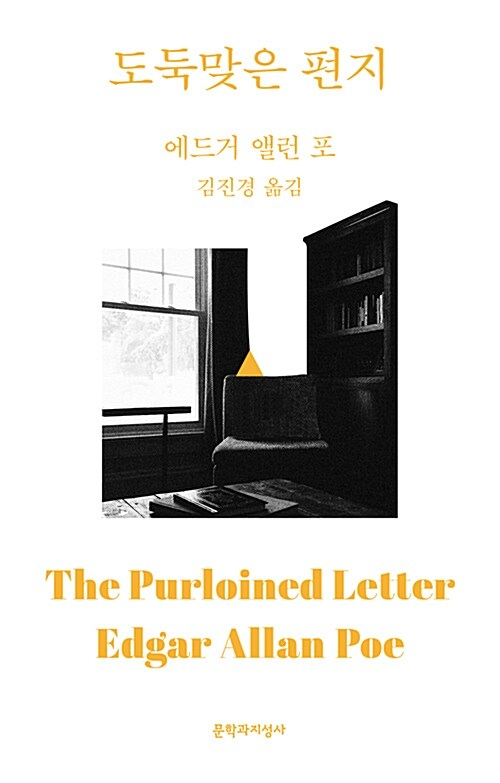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 아니 도둑을 내가 집안으로 들였다. 아버지 회사 직원이라고 속이고는 급한 일로 심부름 왔다고 하기에 대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심부름은 어딘가에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는 것. 나와 그 도둑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장롱을 부수기 위해 망치를 가져온 것도 나였다. 결국 장롱 서랍 뒤편에서 약간의 돈을 찾아냈고, 도둑은 그대로 가버렸다. 실은 도둑이 가져간 액수의 몇 배에 달하는 현금이 집에 있었는데 눈에 쉽게 띄는 곳이었다. 내가 살면서 저지른 가장 어처구니없고 멍청했던 유년시절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소설.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도둑맞은 편지'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어느 귀부인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도둑맞았다. 범인은 D장관이고, 부인도 그가 편지를 훔치는 순간을 목격했다. 편지를 되찾아야 하는 임무는 경시청장 G에게 주어졌고, 장관의 집을 수색했지만 편지를 발견할 수 없던 청장은 뒤팽과 화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한 달이 지나 뒤팽의 집을 찾은 경시청장은 그에게 5만 프랑의 수표를 써주고는 귀부인이 잃어버린 편지를 받는다.
'도둑맞은 편지'는 40쪽에 불과하지만, 마치 서스펜스의 거장 히치콕 영화를 보는 듯하다.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려줌으로써 시간 지연으로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방식(뒤팽이 편지를 찾는 과정에 대한 장황한 설명)과 흡사하기 때문. 이를테면 사건을 구성하는 조건이 독자에게 긴장과 혼란을 초래할 질료가 된다는 얘기다. 조건은 이렇다. D장관이 범인이라는 것을 귀부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D장관도 알아야 한다. 편지 소유자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니 먼저 편지를 되찾은 다음, 편지 바꿔치기를 통해 편지가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장관이 모르면 더 큰 복수를 이룰 수 있다. 자신이 훔친 편지가 귀부인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귀부인을 통제하려 들 때 벌어질 재앙, 즉 장관이 맞닥뜨릴 귀부인의 반격 말이다. 게다가 누가 편지를 빼돌렸는지 궁금해 할 장관을 위해 단서까지 남긴다면 금상첨화.
작가의 다른 단편 '아몬티야도 술통'에서 화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누가 복수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복수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가문의 모토가 '누구든 나를 해하는 자는 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뒤팽의 행위는 지극히 포의 인물답다.

뒤팽의 입을 통해 독자에게 해설하는 방식은 고전적이다. 경시청장의 수사는 "케케묵은 관습을 좀더 늘리든가 부풀릴 뿐"(25쪽)이라면서 오랫동안 임무를 되풀이하며 익숙해진 일련의 수색원칙을 부풀려서 적용한 게 실수였다고 분석한다. 편지는 누구나 숨길 법한 곳이 아닌 누구라도 상상하지 못할 흔하디흔한 장소에 놓였던 것. 뒤팽은 범인의 성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상상력을 동원한 다음 목표물을 찾아내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과 D장관 사이의 사적 복수까지 감행하는 통렬한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라캉은 '도둑맞은 편지'를 분석하면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행위를 거쳐 편지는 항상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말한다. 범인을 만천하에 공개하고도 의기양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포의 솜씨라니. 40쪽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랜 세월 다양한 예술에 영감을 제공한 까닭이다.
영화평론가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
尹 선고 지연에 다급해진 거야…위헌적 입법으로 헌재 압박
'위헌소지'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되나(종합)
직무 복귀 vs 조기 대선…4월 4일은 尹대통령 '운명의 날'
순대 6개에 2만5000원?…제주 벚꽃 축제 '바가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