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진이 세상을 폐허로 만들었다. 서울에서 낡은 '황궁아파트', 그중에서 103동만 멀쩡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영탁(이병헌 분)을 지도자로 뽑고, 생존을 위한 규칙을 만든다. 그들의 구호처럼 '아파트 밖은 지옥'이다. 굶주림과 추위는 인간성을 말살한다. 노숙자들이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도 돈다. 외부의 생존자들이 황궁아파트로 몰려들지만, 황궁 주민들은 이들을 차단한다. 하나, 콘크리트로 된 낙원(바깥세상에 비해)은 견고하지 못하다. 공동체의 유대는 허물어진다. 아귀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절망스러운 재난에서도 '전세'와 '자가'로 신분을 가른다.
지난해 8월 개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개요다. 모처럼 만난 웰메이드(well-made) 영화다. 대종상 6관왕을 차지했으니, 명불허전(名不虛傳)이다. 이 영화는 물질과 욕망에 취약한 인간과 세상의 실상을 보여 준다. 유토피아는 낙원의 상실과 회복을 담는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제목은 역설적이다.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현실은 디스토피아다. 세계 문학사를 보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1917년) 이후 디스토피아 문학이 유행했다. 디스토피아 문학은 유토피아의 그늘을 부각한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결이 다르다.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꼽히는 작품이 있다. 예브게니 자먀찐의 '우리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다. '멋진 신세계'와 '1984'는 잘 알려진 작품이나, '우리들'은 낯설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 국가인 소련에서 나온 '우리들'(1920년)은 디스토피아 소설의 전범(典範)이다. 이 소설은 스탈린 정권을 겨냥한 날 선 풍자다. 노동자·농민의 세상을 추구한 혁명이 독재와 파시즘으로 변절됐음을 고발한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간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인간의 삶과, 세상을 향한 알레고리(allegory)다. 현실의 아파트는 욕망의 바벨탑이다. 아파트는 물질만능주의로 뒤틀린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거주하는 아파트의 값이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태다. 아파트는 장애인시설, 장례식장, 웨딩홀을 거부한다. 돈 앞에서 배려, 애도, 축하의 공간은 설 곳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아파트)는 과연 낙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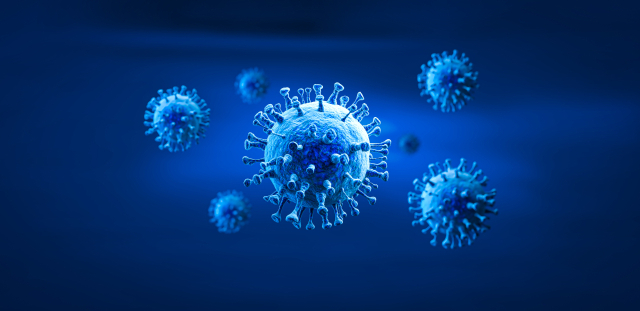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