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리카 케냐에는 '플라잉 토일렛(flying toilet)'이라는 게 있다. '하늘을 나는 화장실'쯤으로 번역할 수 있다. 실제로는 비닐봉지에 담긴 똥이 하늘을 나는 것이다. 도시 빈민가나 시골을 중심으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한다. 상하수도 인프라가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냄새 탓에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변소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한밤중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러 갔다가 성적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는 것이다. 집 안에서 용변을 본 뒤 배설물을 담은 비닐봉지를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날려 버리는 바람에 '플라잉 토일렛'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분뇨는 농업국가에서 지력을 높이는 데 귀하게 쓰였다. 19세기 초 일본 오사카의 강과 운하를 오가는 분뇨선(船)은 외국인들의 눈에 희귀한 볼거리였다고 한다. 1776년 무렵 등록된 분뇨선만 2천 척이었다고 한다. 일본에서 서양의학을 처음 가르친 유럽인인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의 '에도 참부기행(參府紀行)'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실렸는데 1826년 5월의 일기에는 "오사카에서 특별히 만든 비료선이 온다. 사람들은 이것을 각종 정원수나 곡식에도 뿌리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6~8월에는 대도시 주변 지역이 더러워져 경치를 즐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썼다.
1859년 영국 주일공사 러더퍼드 올콕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마을에서 논밭으로 보내는, 뚜껑이 없는 액체 비료통을 운반하는 이들이나 '위험물'이라 할 수 있는 인분뇨를 실은 말들이 줄지어 지나가는 건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1878년 분뇨 취급 규칙을 제정해 똥의 가치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값을 매기는 등 체계적으로 다뤘다. 다이묘의 저택에서 나온 건 최상품, 일반 가정은 중등품, 감옥이나 유치장에서 나온 건 최하품이었다.
분뇨가 오물 취급을 받은 건 페스트 유행이 계기였다. 1889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고베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페스트가 번지면서다. 1910년 일본 최초의 폐기물 관련 법률인 '오물청소법'이 제정된다. 관에서 오물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분뇨를 무기로 썼다. 접촉 순간부터 멘털을 무너뜨리는 기괴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아챈 것이다. 정약용이 외적의 침입이 잦은 접경 지역의 향토방위 전술 전략을 연구한 저술 '민보의(民堡議)'에는 인분 활용안이 적혔다. 요새와 진지에 똥독을 묻어 놓고 똥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똥을 모아 물과 섞어 휘저어 놨다가 대나무통에 넣어 적이 다가오면 얼굴에 쏘는 것이었다. 바가지로 끼얹으면 조준이 정확하지 않고 똥물을 낭비하게 되니 대나무에 넣어 쏘라고 했다. 일명 '분포(糞砲)'다. 살상력은 약했지만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냈다.
설마설마했다.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는 시대에 북한은 5㎏이 넘는 '오물 풍선' 안에 분변을 넣었다. 우리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쓰레기로 보고, 똑같이 쓰레기를 날려보내 응징한다는 북한식 동태복수(同態復讐)다. 삐라(ビラ, 선전 전단)의 목적은 우월한 체제 선전인데 고전적인 삐라의 형태로 체제 우월성을 홍보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 풀이해도 무리는 아닌 듯하다. 다만 우리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는 심리 전략은 통한 것 같다. 그러게 왜 대북 전단을 보내서 이런 수모를 겪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다. 마땅한 대응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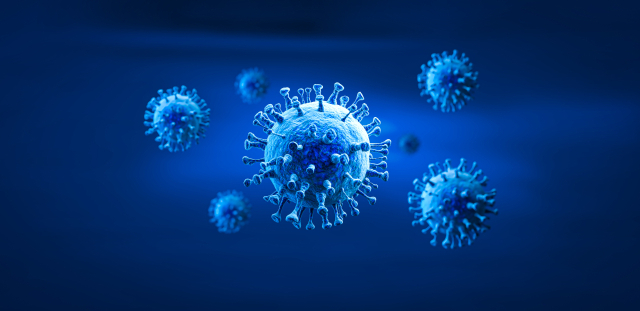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