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도에서 만난 소장수 신정섭씨는/ 꼭 세마디만 가지고 소를 몬다./ 고삐당겨 이랴이랴로 끌고/ 딴곳으로 가려는 소 어려어려로 막고/ 힘들어 숨차하면 워워로 세운다." 지난달 22일 세상을 떠난 신경림 시인의 시, '소장수 신정섭씨'의 앞 부분이다. 이 시는 1990년 출간된 기행시집 '길'에 수록돼 있다.
신정섭 씨는 소장수다. 그는 소에 관해서는 일가견(一家見)이 있다. 소가 눈만 껌뻑해도 어디가 가려운지, 귀만 쫑긋해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안다. 예민한 감수성, 탁월한 공감력이다. 그래서 신정섭 씨는 '이랴이랴' '어려어려' '워워' 세 가지 말로써 소를 잘 몰고 다닌다. 그는 위정자들을 힐난한다. "그래서 소장수 신정섭씨는 세마디만 가지고/ 세상을 몰겠다는 사람들이 밉다./ 백성의 어데가 아프고/ 어데가 가려운 줄도 모르면서/ 이랴이랴로 끌고 어려어려로만 다스리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밉다 못해 가엾다."(같은 시, 중간 부분) 백성의 근심과 바람을 모르면서 정치를 하겠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시깨나 읽은 사람들은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갈대' 등을 신경림 시인의 대표작으로 꼽는다. 이에 비해 '소장수 신정섭씨'는 덜 알려져 있다. 이 시는 풍자에서 압도적이다. 물론 우리 문학에서 정치 풍자시의 으뜸은 고 김지하 시인의 '오적'(五賊·1970년·사상계 발표)이다. 그러나 '소장수 신정섭씨'는 '오적'에서 느낄 수 없는 골계미(滑稽美)가 있다. '오적'을 읊조리면 섬뜩한 살기를 느끼지만, '소장수 신정섭씨'를 읽으면 실실 웃음이 나온다.
'소장수 신정섭씨'는 사회 부조리를 비판한다. 시가 나온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세상은 그토록 진부한가? 정치는 국민을 편 가른다. 국회의원은 특권만 챙기고 국민을 돌보지 않는다. 배움이 짧은 소장수에게 욕을 먹어도 싸다.
해맑은 얼굴과 달리, 신경림 시인의 현실 인식은 날카롭다. 그는 11년 전 어느 문학 특강에서 자신의 시적 경향을 밝혔다. "사람들은 나를 농촌 출신 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현실에 뿌리박은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현실에서 체득된 감성을 서정적으로 노래한다고나 할까요." 시인은 탄광의 카나리아, 잠수함에 탄 토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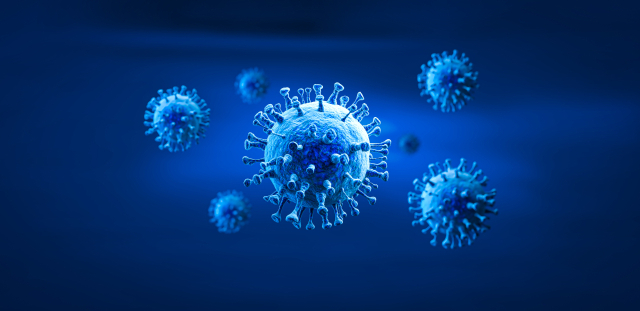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