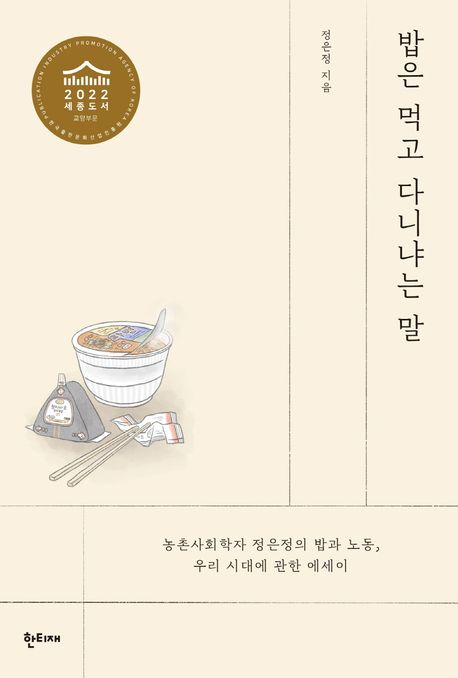
결론부터 말하자.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나는 이 책을 시민보다 입법에 관여하는 이들이 읽어야 한다고 믿는다.
삶에 지쳐 생을 끊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살아 있는 동안 인간은 먹을 수밖에 없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다. 먹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먹고사는 일에 소홀하지 말자는 당부이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람과 환경도 돌아보자는 간청이다.
저자는 학교 입학식에 정치인과 지역 유지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세상에서 급식노동자를 챙긴다. 소년범의 급식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짚는다. 결핍은 인정사정이 없다고, 그러니 가난하지 말자고. 먹거리를 다루는 자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먹고 마시는 일에 존엄을 유지하자고 요청한다. 목소리는 힘이 있지만 소란피우지 않고, 시종일관 논리정연하다.
예식장과 산부인과와 우체국이 사라지는 농촌 세태를 다룬 장은 먹먹하다. 농촌경제의 중심인 농협에서 결혼과 장례를 치르던 풍경은 사라지고 상조회가 장례를 주관하는 시절에 "성실하고 선량했던 이웃들이 우리 곁에 머물다 떠났다는 것을" 기록하겠다는 마음을 곳곳에 흩뿌린다. 그런데 저자의 매서운 눈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고령화·여성화 돼가는 농촌 반대편에 놓인 '청년 농업인 육성'의 이면까지 포착하는 예리함. 그리하여 등장하는 숙연해지는 문장 한 줄이다. "평생을 땅에 붙어 농사를 지어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지역을 지킨 거칠고 귀한 손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공공으로 표명해야만 청년 농민도 자신의 존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년 농부가 고령 농민으로 살아가게 돕는 것은 "청와대에 불러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태웅 군이 살아가는 현장의 고령 농민을 예우하는 일이다"라고 일침을 놓는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박 겉핥기식 컨설팅의 폐해와 TV에 나와 기술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자영업자를 질타하는 유명 방송인이 기술 없이도 창업 가능한 최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아이러니를 지적할 때면 무릎을 칠 수밖에 없다. 요즘 눈에 띄게 늘어나는 공공기관과 종교시절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생각도 곱씹을만하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챙기려는 뒤늦은 노력이 쉽사리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건 노동현장의 딜레마와 맞물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꼭지가 못내 아쉬운 이유이다. 영세업체의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과 한 번의 제재로도 사업체를 닫아야할 만큼 허약한 구조를 메우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과한 정치구호 앞에서 먼저 몸이 움츠려들었다는 사실도 고백해야겠다.
책이 나온 건 코로나로 생사가 절체절명이던 2021년 가을이다. 세상사 만 가지 일중에서 나와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관심 가지고 지켜본 일 또한 거의 없었다는 부끄러운 현실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은 내게 죽비 같은 책, 따끔하고 개운하다.
영화평론가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정치 보복' 않겠다는 이재명…"제 인생에 보복한 적 없어"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헌재재판관 지명 위헌 논란…한덕수 대행 역풍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