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인태 시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생라면을 먹으며 '생은 라면'이라는 기발한 연상을 한다. 꼬인 날이 많았던 시인은 "삶도 라면처럼 꼬일수록 맛이 나는 거라면/ 내 생은 얼마나 더 꼬여야/ 제대로 살맛이 날 것이냐"라고 되묻는다. 꼬여서 고통스러운 생이지만, 꼬이지 않은 인생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자문자답하는 '라면 같은 시'는 "먹고사는 일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비애(悲哀)"가 아름답게 측은하다.
누구나 한두 번은 들어 봤을 시(詩)이며 가끔은 한 구절씩 읊조리며 고달픈 현실을 잊거나 참아보려 노력도 했을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했다.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라는 것이다. 슬픈 날을 참고 견디게 하는 꼬불꼬불한 라면이야말로 시인을 존재하게 하는 고마운 글 벗이다.
늦은 밤 좀처럼 써지지 않는 원고를 긁적이다가 연신 줄담배로 주린 배를 연소시키는 시인에게 라면은 구세주 같은 벗이 아닐 수 없다. 늘 호주머니에서 동전만 짤랑거리기 일쑤인 가난한 시인으로서는 라면이 한 끼 식사도 되고, 소주 한두 병은 거뜬히 비우는 안주도 되니 얼마나 든든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야심한 시간에도 뱃속이 출출해지면서 라면 생각이 간절해진다. 지병 때문에 먹어서 안되는 금지 식품이지만 기어이 라면 한 그릇 끓이기 위해 냄비에 물을 얹는다. 뽀글뽀글 젓가락이 춤추기 시작한다. 허기진 세월에 스프를 넣고 고뇌와 희망을 고명으로 얹은 라면 한 그릇의 맛은 정말 기막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을 먹어왔다. 평균 한국인들은 매해 36억개, 1인당 74.1개씩의 라면을 먹으며 살아간다고 한다. '거리에서 싸고, 간단히, 혼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라면은 꼬불꼬불한 생의 애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에는 식사와 사교를 겸한 번듯한 자리에서 끼니를 고상하게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리에서 밥벌이를 견디다가 허름한 분식집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혹은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궁상맞음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다.
매운 국물들을 빠르게 들이켜고는 각자의 노동과 고난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가파른 세월을 안고 걸어가는 꼬불꼬불한 우리들의 생은 분명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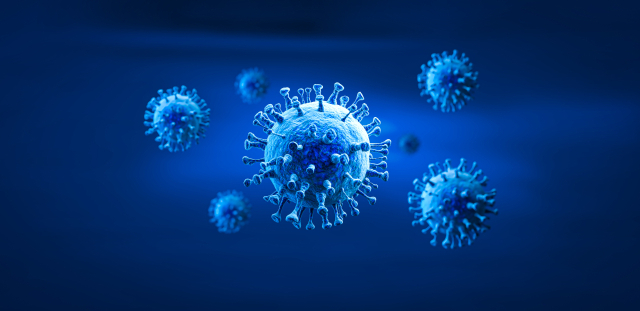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