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 어느 향수가 있어 '어머니' 내음보다 향기로울까. 나에게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다.
담장 아래 핀 봉숭아꽃을 지극하게 바라보던 소녀 같은 그때, 장독대 먼지를 닦던 뒷모습은 화석이 되어 그리움이란 이름으로 착상되었다. 보라색 댕기, 쪽 진 머리를 가로지른 금비녀는 여전히 내 가슴에서 반짝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머리에 두른 흰 수건, 연한 옥색 치마저고리, 발끝까지 내려온 앞치마, 하얀 고무신을 신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때, 인고의 세월을 견딘 듯 주름진 굵은 손마디 등 수없이 많다.
어머니 모습만 떠올려도 마음은 이내 잔잔하게 정화되며 먼 추억 속 향기에 젖는다. 그런 까닭에 내게 어머니의 메타포는 그리움이다. 대학원 다닐 때 미술치료 과제에서 어머니의 일생을 과제로 제출하게 된 것도 그때의 향기를 잊을 수 없어서다. 시시때때 스며드는 어머니의 추억은 팍팍한 현실을 지혜롭게 나아갈 자양분이다.
나에게 6월은 가혹하기만 하다. 친구들이 친정엄마 보러간다는 말이 가장 부럽다. 그때마다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 어머니 기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요즘 들어 부쩍 어머니가 그립다. 어머니에 대한 쓰라린 애착.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며 간절하게 원하지만, 야속하기만 하다. 형벌 같은 슬픈 그리움이다. 두꺼비 헌 집, 새집 토닥이듯 가슴에 묻고 쌓아둔 소리 '엄마' 소리 내어 불러 보고 싶다.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빈 들판의 바람조차도 두리번거리게 만드는 고요 속의 그 소리가 나의 엄마다.
수년 전 어머니는 몹쓸 병마가 찾아와 급하게 떠나셨다. 눈에 밟히는 막내딸을 두고 어찌 가셨는지 야속하기만 하다. 96세의 연세에 입원하시는 그날까지 고추밭 걱정하시다가 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 '길면 삼 개월입니다.'
자식을 향한 깊고 높은 숭고함을 아프게 지켜보았다. 돌이켜 생각해도 나는 엄마의 딸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의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 곡기를 못 드시게 하니 육신은 죽고 정신만 살아계시던 어머니, 나는 작정하고 대구에서 고향 거창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고속도로 달려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어머니 특유의 향기와 따스한 온기,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기억 속에 담아 두고 싶은 애절함이 앞섰던 듯하였다.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서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평생 비녀를 고집하시던 어머니는 싹둑싹둑 잘려 내동댕이치는 머리카락을 보시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셨다. 아마도 죽음이라는 운명에 순종한 듯하다. 처음 마주한 짧은 머리를 비춰보며 수줍어하시는 모습에서 살을 에는 아픔을 느꼈다.

16살 소녀 같으면서도 흔들리는 눈동자, 어색하게 머리를 만지시든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두 달이 지나도 퇴원이 안 되자 어머니는 온전히 스스로 이생에서의 삶은 마지막임을 인식하셨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당신께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 애를 썼다. 그때의 어머니 냉정함은 차라리 설움에 겹다. 입원 후 입버릇처럼 하시던 고추밭 이야기도, 집에 가자는 말씀도 더는 없었다.
그리고 평생 허리춤에 매고 다니시던 선홍색 돈주머니를 열었다. 조카, 손녀, 손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다.
"야들이 돈 줘야 좋아하지, 늙은 할미 보고 싶겠나" 하시며 밝게 웃던 어머니. 나는 돈주머니가 비면 더 빨리 마무리될까 싶어 빈 주머니를 재차 채워 두었다. 그때 어머니 선홍색 붉은 주머니는 지금 나의 보물 1호다.
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자고 아침이면 간병인과 엄마만큼 늙은 언니에게 부탁한 뒤 출근하고 주말에는 엄마 곁에 함께 있었다. 그런 나를 어머니는 오히려 걱정이다. 침대 하나에 둘이 누워 자면 어머니는 죽어가는 육신을 들썩이며 밤새 내 자리를 돌보신다. 내 자리를 내어 주시려고 안간힘을 쓰신 것이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머니가 내게 주는 마지막 정이라 여기고 그냥 받아주었다. 대신 내 가슴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기운이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되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먼 길 가시는 마음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 편히 땅을 디딘 적 없는 북소리 같은 현실 앞에 오직 자식을 향한 바쁜 발걸음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 이 여인을 축복해 달라며 눈물을 훔쳐야 했다.
입원 석 달이 끝날 때쯤이었다. 병원의 진단은 정확했다. 푸르고 싱그러운 세상, 자연이 녹색의 축제를 벌이려는 6월에 어머니는 떠나셨다. 나에게 "너거는 잘 있거라, 나는 내일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 한없는 그리움만 남겨 두고 고운 모습으로 떠났다.
나는 어머니 딸이었다. 내 딸들도 그러할까.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저들도 시시때때로 나를 그리워할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부끄러워진다. 따뜻한 말 한마디, 온화한 미소, 온갖 정성을 다하셨던 어머니를 떠올린다.
나도 그런 엄마가 되어야 할 터인데. 솜털 간지러운 미풍에도, 아카시아 향기 속에도, 아침햇살에도, 저녁노을에도, 실개천 소리에도, 어느 곳에서도, 죽어서도 살아있는 그리움의 어머니로 남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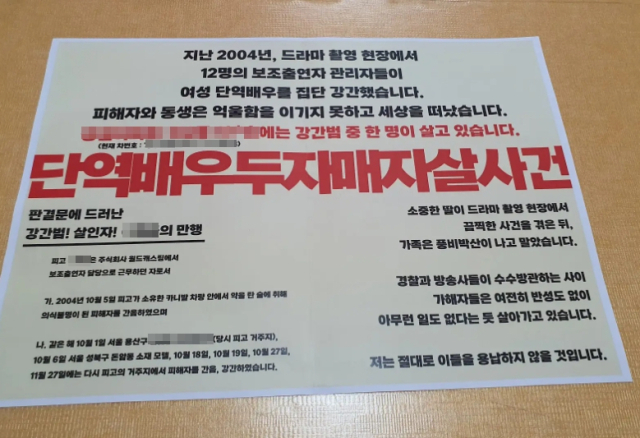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300만 육박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열흘 만 70만 동의
'윤석열 탄핵' 청원 60만 돌파 '10만 추가에 하루도 안 걸려'
2년 만에 1억5천만원 올라…'미분양 무덤' 대구서 가격 오르는 이 지역
'대장동' 김만배에 돈 빌린 前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대통령실 "김여사 디올백,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