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오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 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잊으려 옛날 일을 잊어버리려/ 불빛에 빗줄기를 세며 갑니다."
가곡 '그 집 앞'은 1933년 이은상이 작사하고 현제명이 작곡했다.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소월의 시가 생각난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대로/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가는 길' 부분),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못 잊어' 부분),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시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시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먼 후일'부분)
시든 노래든 반복이 만들어 내는 리듬은 아름답다. 삶이 일상 반복의 연속이듯. '그 집 앞'은 4분음표로 이어지는 단순한 멜로디와 화성의 반복이 주저와 망설임의 정을 가지런히 질서화한다. 단순함은 연민의 정을 깊게 풀어내는 측면이 있다. 한데 왜 그 집 앞을 눈에 띄지 않게 지나야만 했을까. 여러 차례 다시 가면서도 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을까. 그 시대엔 모두 수동적이고 자기표현이 서툴렀던 것일까. 그 심정을 알 듯도 하지만 그리움이나 미련이라고 얼버무리기엔 가슴이 답답하다.
2절엔 굵은 빗줄기 속을 우산도 없이 간다. 비는 화자의 눈물을 감추는 장치가 된다. 그룹 아프로디테스 차일드(Aphrodite's Child)의 노래 '레인 앤 티얼즈(Rain and Tears)'에 이런 가사가 있다. "Rain and tears are the same(비와 눈물은 같은 거예요)/ But in the sun you've got to play the game(하지만 태양 아래선 감춰야 하죠)". 아폴리네르의 시 '언덕'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울고 울고 또 울어보자/ 달이야 보름달이건/ 까짓 초생달이건/ 울고 울고 또 울어보자/ 햇볕에서는 참 많이도 웃었다니까."
남자라고 왜 울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 하지만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통념 때문에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마음을, 속 편하게 우는 심지어 눈물을 무기로 삼는 여자가 어떻게 알 것인가. 한데 노래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어쩌다 그 집 앞을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발길이 그 집을 향하고 있다. 간절한 그리움의 표현이지만 그렇게라도 스스로 심리적 안정과 자기 위안을 삼으려는 행위이다.
이 노래가 갑갑해 보이는 이유는 궁핍한 시대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자유가 없는 현실은 식민지인을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자신감과 결단력, 감정처리 능력이 부족한 것은 어쩌면 그 시대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풍요의 시대엔 누구도 자기표현을 억제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 시대는 억압받던 시대의 소극적이고 소심한 정서로는 공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삶이 윤택해지면서 한국인의 성격은 자기표현이 분명한 외향성으로 바뀌어 갔다. 전 국민의 연예인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노래와 춤, 장기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눈물과 한의 노래들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누구나 마음속의 '그 집 앞'이 있을 것이다. 주위를 배회하며 망설이다가 용기가 없어 사랑을 놓친 애잔한 사연들을 그 시대만 해도 이 노래가 대변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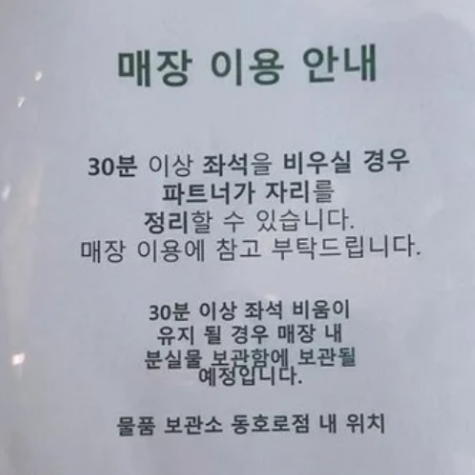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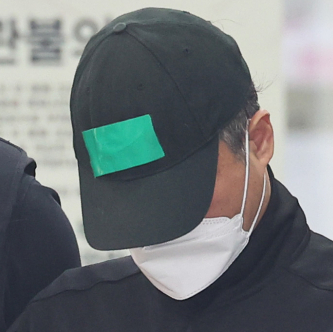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