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改革)은 혁명(革命)보다 어렵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회고록에서 했던 말이다. 역대 정권이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공언했지만, 성공 사례는 드물다. 혁명은 힘으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 새 질서를 창출한다. 반면 개혁은 반대 여론을 안고 합의를 바탕으로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의 과정은 지난(至難)하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한 게 개혁의 숙명일지 모른다. 숙명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개혁의 주체는 주도면밀해야 한다.
"내가 연금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지지율보다는 국익을 선택했다." 지난해 3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TV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당시 연금 개혁을 추진하던 마크롱은 궁지에 몰렸다. 국회 과반인 야당과 강성 노조가 연금 개혁 반대를 주도했다. 국민의 대다수도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다. 총파업으로 열차가 멈췄다. 화염병과 물대포가 등장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마크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노조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다. 그리고 정부 단독 입법이 가능한 '헌법 49조 3항 발동'이란 초강수를 뒀다. 우여곡절 끝에 마크롱은 보험료 인상과 납입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연금 개혁을 완수했다.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개혁은 이처럼 가시밭길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혁도 절박하다. 2055년이면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기금 소진 시기는 2007년 연금 개혁 때 2060년으로 예상됐으나, 앞당겨졌다. 역대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방치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꺼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기롭게 나섰다. "개혁으로 지지를 잃더라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낸 연금 개혁안은 '맹탕'이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같은 구체적 수치 없이,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정부가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연금특위를 구성했다.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까지 했다. 특위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44%로 높이는 안을 도출했다.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이 상황을 뒤집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했던 것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국민연금·기초연금·공무원연금 등 여러 연금을 조합해 다시 설계)을 함께 추진하자며 개혁안 처리를 거부했다. 빈약한 명분이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은 무산됐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는 있다. 첫째,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이다. 둘째, 공론화와 여야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13%'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빨리 모수·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갈 길은 멀고 험난하다. 구조개혁은 연금 체계의 판갈이다. 이는 모수개혁보다 훨씬 복잡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구조개혁의 관건이다. '반쪽'으로 개원한 22대 국회가 개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가 특검법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 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집중하길 바란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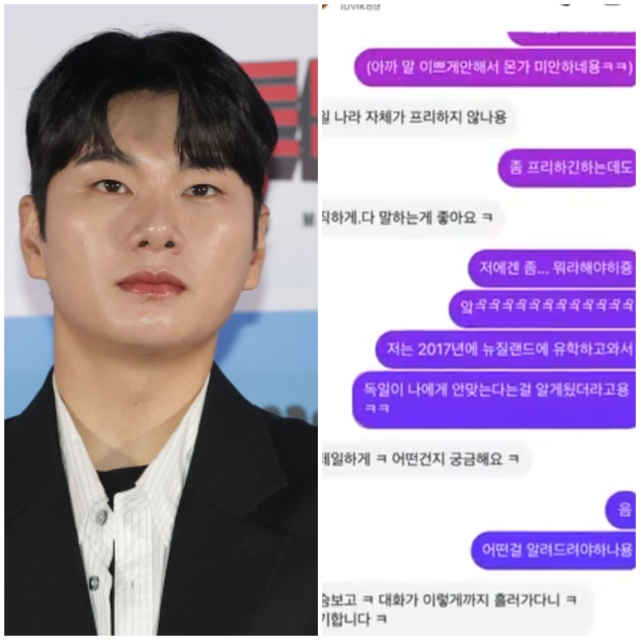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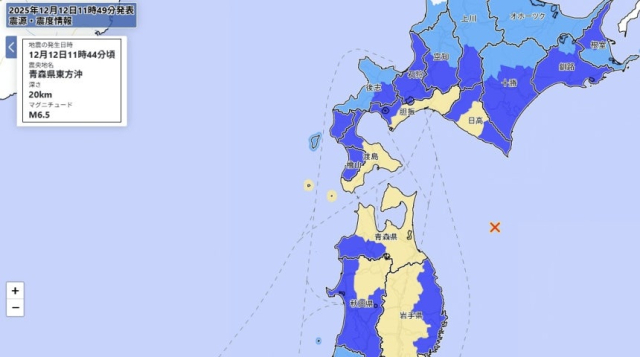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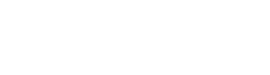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