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부동산 지식들 위로 빨간 줄이 그어지고, 자그마한 별표가 달린다. 뒤이어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교수의 말을 바쁘게 받아 적는다. 대학의 강의실 같은 풍경이지만 수업을 듣는 이는 대학생이 아니다. 인생 2막을 펼치고 있는 노인들이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부동산세를 공부하고 있었다.
지난 4월 대구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노인인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노인이 늘어난 것에 비해 일하는 노인은 많지 않다. 대구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각 6.5%포인트(p), 6.6%p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득이 없는 노인은 늘어났다. 소득 하위 70%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지난 2017년에 비해 2022년 25.4%나 늘어났다. 수령자와 액수가 꾸준히 늘면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허리가 휘고 있다.
통계가 말해주듯 대구는 어쩌다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이 가득한 곳이 됐을까. 현장은 예상과 달랐다. 일하고 배울 마음이 가득한 '젊은' 노인이 눈을 반짝거리고 있었다.
갓 은퇴한 이들은 노인 교육 강의를 찾아 듣고, 인생 제2막을 꾸릴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한 프로그램에서 만난 노인은 "티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면 카페와 찻집을 차릴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 봉사도 나갈 수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안타깝게도 이들을 위한 무대는 준비되지 않았다. 만 65세를 넘기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취급을 받는다.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신체 능력이 떨어진 고령 노인을 위한 단순노동 업무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노인 딱지를 붙이기 전, 노령기에 일자리를 미리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예비 노인인 50대를 위한 정책도 드문 탓이다.
종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볍진 않다. 대구 소재 한 노인복지관 관계자가 "초고령층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60대는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용자도 있다"며 "젊은 노인들을 복지관 회원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 노인들은 마음 붙일 곳도 없어 보였다. 노인정과 경로당은 골목 구석구석에 설치돼 노인들의 사랑방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이용 노인들이 새 이용자를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젊은 노인들에게는 '이용 불가' 구역으로 취급된다. 이렇게 젊은 노인들은 점점 더 '노인 인프라'와도 멀어지고 있다.
젊은 노인을 위한 도시는 꿈만 같은 이야기일까. 젊은 노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닦도록 돕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의 경우 50플러스센터를 운영해 노년기를 맞이하기 전 닥쳐오는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을 맞이하기 전부터 노년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중이다.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슬로건과 달리 '노인'이라는 딱지만 붙어 있으면 자유와 활력을 잃은 존재로 취급해 왔다. 지금부터라도 노인을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갓 은퇴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움직일 준비가 된 노인들은 현장에 이다지도 많다. 이제 대구가 정책으로 화답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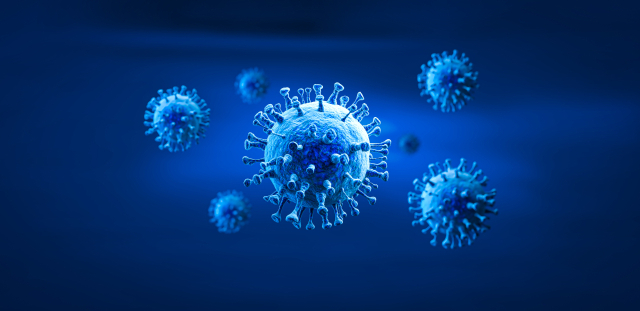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