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밍웨이는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행운이 그대에게 따라 준다면,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평생 당신 곁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험한 '빛의 도시'(La Ville Lumière) 파리의 외양은 낭만 그 자체였다. 센강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등 수많은 미술품과 나폴레옹 집무실이 역사의 한순간에 나를 데려다 놨다.
그림자 없는 빛은 없다. '프랑스에서 파리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할 만큼 유독 발달한 도시와 이곳에 잔뜩 쏠린 국가 기능 및 인구, 향수 산업의 발달 배경을 가늠케 하는 악취, 값비싼 주거비와 물가,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까지. 과거 이곳에 바리케이드 수십 개가 세워지고 시민들 피로 흥건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름마저 돋는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대혁명 전후 프랑스 왕국과 7월 왕정, 실패한 '6월 봉기'를 겪던 파리의 모습을 담았다. 소설임에도 '세계를 담았다'고 평가받는다. 장 발장 얘기를 빼고 그 전후 배경만 보자. 1789년 극심한 빈곤과 신분제에 대한 불만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국왕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포한 혁명 지도부는 밖으로는 혁명 확산을 우려한 인접국 군대와 싸우고, 내부로는 반혁명 세력과 권력을 다퉜다.
군인 출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1통령으로 취임했고, 출렁이는 물가와 정치 갈등을 안정시키자마자 스스로 황제가 돼 외국과 전쟁을 일삼았다.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이 몰락했고, 부활한 왕정에 거듭 탄압받은 시민들은 1830년 혁명을 일으켜 루이 필리프 왕을 추대한다. 그럼에도 산업화의 열매는 귀족화한 부르주아에게만 허락됐다. 자유를 찾아 싸웠던 민중들은 '빵'을 얻고자 6월 봉기를 일으켰고, 비록 실패했지만 수많은 시민의 피로써 왕정에 거세게 항거했다.
이후 나폴레옹 3세의 즉위, 급진 좌파 세력의 자치정부 '파리 코뮌' 등 혼란이 이어졌다. 1870년 극좌와 극우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안정된 민주주의 공화정(제3공화정)이 들어서기까지 100년이나 걸렸다.
'혼돈의 도시' 파리를 중심으로 한 100년의 역사를 절반으로 압축하면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된다. 서울도 파리처럼 전쟁과 혁명, 고도의 발전과 정치적 성장 등 기구한 역사를 겪었다. 그러나 이방인 눈에는 청와대와 경복궁, 남산, 한강 역시 마냥 아름다운 도시의 요소로 보일 것이다.
근대화의 시계가 너무 빨랐던 탓일까. 국내 정치는 안정되지 못한 채 거대 양당의 갈등이 감정의 극단으로 치닫기 일쑤다. 파리 일대 수도권 '일드프랑스'보다도 작은 경기 권역 수도권에는 그 2배나 되는 2천600만 명이 '지방보다 나은 삶'을 찾아 개미 떼처럼 몰려 산다.
최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파도에 올라탔다. 이번만은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제자리를 찾았으면 한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때때로 의견 대립이라는 갈등도 생길 것이다. 그것이 의사결정과 통합의 과정을 지난하게 만들지라도, 훗날 돌이켰을 땐 '낭만의 도시를 만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부족하거나 나쁜 모습은 떨쳐내고, 서울이나 파리 못지않은 '축제 같은 도시'가 돼 내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 성장을 고대하는 시도민의 공통된 염원이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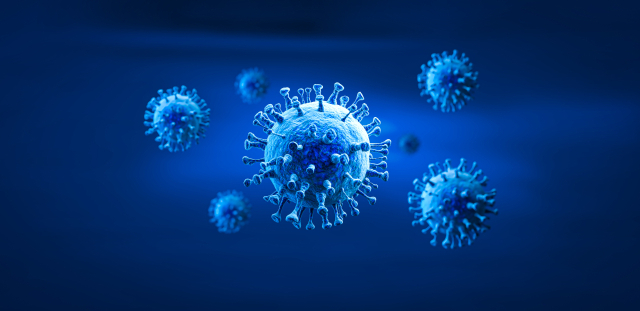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