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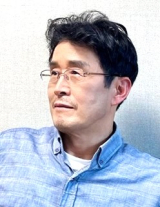
'맥베스'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은 맥베스 부인이다. 대체로 권력욕에 눈이 멀어 남편을 파멸로 몰고 간 악녀로 이해한다. 현대로 오면 강렬한 존재감으로 인해 페미니스트들이 눈독을 들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드라마를 자세히 보면 그녀가 실제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연출, 즉 위악(僞惡)이고 진심은 오직 남편에 대한 사랑뿐이라는 것이 필자의 독법이다.
맥베스 부인의 욕망은 왕비 자리가 아니라 왕이 되고 싶은 남편의 욕망을 채워주려는 사랑이다. 왕을 시해하고 왕좌를 찬탈하는 대역죄라 해도 상관없을 만큼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녀는 왕비가 된 후 열린 궁정 연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폐하, 저 대신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환영한다고요."(III.4) 자신의 당연한 발언권을 모두 남편에게 위임하는 모습이다. 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이때는 맥베스의 마음이 혼미한 상황이라 자신이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라면 남편 대신 연회를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대신에 그녀는 "모두 서열 따지지 말고 즉시 나가 주세요."(III.4)라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연회를 조기에 해산해버린다.
맥베스 부인이 남편에게 왕을 죽이고 왕좌에 오르라고 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이전부터 그런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걸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은 안 하려는군요."(I.5) 그 악역을 자신이 기꺼이 맡는다. 사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근본이 악하지 못한 사람이 악을 행하려면 마음을 악독하게 먹어야 한다.
"자, 너희들 살인의 음모에 따르는 악령들아, 어서 와서 내 여자의 마음을 없애 버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해다오."(I,5)
본심이 악독하다면 저렇게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남편에게 악에의 용기를 주기 위해 위악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저는 제 가슴에 안은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잘 알아요. 그러나 결단을 내린 일이라면 아이가 나를 보며 웃음 짓고 있다 해도 부드러운 잇몸에서 젖꼭지를 뽑아내고 아이의 대갈통을 박살 낼 거에요."(I.6)
맥베스 부인이 실제로 저럴 수 있는 여자는 아니다. 가정법 과거완료(would have plucked)로 말만 저렇게 할 뿐이다. 실상 그녀는 착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남편을 위해 왕을 죽이겠다고 그의 침대로 갔다가 잠자는 모습이 아버지 같아서 물러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인의 마음은 그저 남편 사랑으로 꽉 차 있을 뿐이다. 남편의 야망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그러면 당신의 사랑도 그런 줄 알겠어요."(I,7)라며 오직 사랑이 식을까를 염려한다. 맥베스의 극진한 아내 사랑은 '위대함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니 '가장 소중한 사랑'(I.5)이니 하는 호명 방식에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예사롭지 않음은 다른 부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덩컨 왕과 뱅코우는 아들까지 낳은 부인이 있지만 언급 한번 하지 않는다. 맥더프는 맥베스의 반란이 일어나자 혼자 잉글랜드로 도망쳐 "그이는 애정도 인정도 없는 사람"(IV.2)이라는 부인의 비난을 산다. 반면에 맥베스 부인은 자신의 본성까지 속이며 사랑에 헌신하다 산화한다. 우리는 맥베스 부인에게서 쉽게 권선징악의 교훈을 얻지만 그녀의 사랑은 선악의 피안에서라도 재심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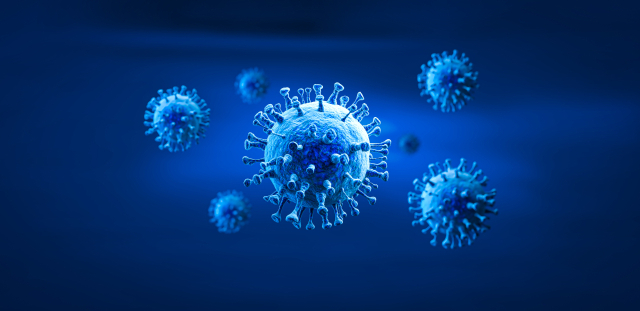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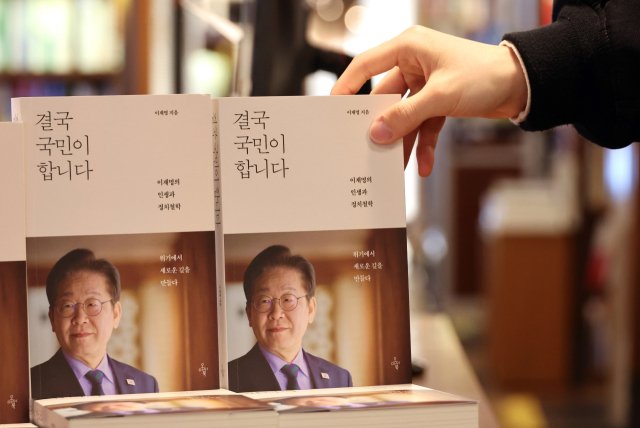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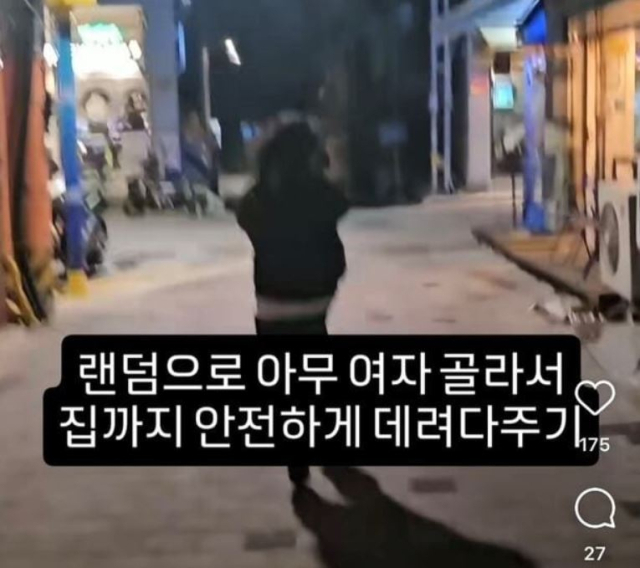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