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을 제안했다. 논의는 급물살을 타 2년 뒤인 2026년 7월 1일 통합을 완수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됐다. 통합이 절실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서 지방 소멸의 위험이 코앞에 닥쳤다.
경북은 2007년, 대구는 2014년부터 지방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노인 수가 20~39세 가임여성 수보다 많아지면 '주의 단계'가 시작된다. 설상가상으로 젊은이들의 엑소더스가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대구경북의 20~39세 청년 2만7천362명이 고향을 등졌다.
2016년보다 83%나 늘었다. "서울은 20대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는 날선 지적도 있다.(임동근 교수) 젊은이들이 떠난 지역은 피폐해졌다. 대구경북 지역내총생산(GRDP)의 전국 비중은 1985년 11.8%에서 2018년 8.7%로 3.1%포인트(p) 감소했다. 이대로 가면 중소규모 경제단위로 전락할 것이다. 통합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사람이 도시로 몰려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Stadtluft macht frei) 중세 유럽의 농노가 장원을 탈출해 도시에서 1년 하루를 지내면, 당시 관습법에 따라 자유인이 되었다. 자유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갈구하는 모든 게 도시에 있다. 하지만 한민족의 도시 사랑은 유별나다. 2021년 기준 90.7%의 한국인이 도시에 산다. 특히 큰 도시에 집착해, 수도권에 50.6%가 몰려 산다. 기업과 일자리, 인프라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 80%, 1천대 기업 75%, 취업자의 51.6%가 수도권에 있다.
도시 문명이 발달한 유럽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영국 12.5%, 프랑스 18.8%다. 일본은 28.0%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가히 병적이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에 나섰을 때, 국가는 수도권과 대기업에 자본을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궜지만, 그 가속기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중앙집권의 오랜 역사이다. 고려는 지방을 느슨하게 통치했지만, 조선은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해 지방까지 촘촘하게 지배했다. 과거제도 한몫했다. 4대 내에 과거 합격자가 없으면 양반에서 탈락했다. 양반 계층에 과거는 필사적 과업이었고, 그 무대가 서울이었다. 오죽하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나왔겠나.
조선과 현대의 역사가 겹치면서 수도권 집중의 병이 도진 셈이다. 그게 지금 한계를 넘어섰다. 첫 희생자는 수도권 거주자다. 작년 수도권 출산율은 0.53명으로 전국 최저였다. 과밀화와 상대적 빈곤 등 열악한 삶 때문이다. 지방은 소외감을 넘어 소멸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주한 미 외교관 출신의 한국통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 정치의 '소용돌이 현상'(the politics of the vortex)도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본다. 소용돌이처럼 중앙을 향해 몰려가, 권력을 놓고 온갖 협잡을 벌이며 민주주의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그의 처방은 다원주의(pluralism)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다. 좀 떨어져 살고, 가치도 권력만이 아니라 다채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산다.
18년 만에 중국 청두에 간 홍 시장은 시골 같던 청두가 2천500만 명의 메가시티로 변모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대구경북 통합을 결심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큰 화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미래 한국의 더 큰 비전일 수 있다. 지방분권을 그냥 지방자치의 실현으로만 보면 안 된다. 수도권에서 곶감 빼서 지방의 허기를 달래는 것도 하책이다.
시야를 넓혀 국가 대개조로 보면 꿈이 생긴다. 대구경북 통합도 지역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를 놓고 생각해 보자. 세종시를 제2수도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구경북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어반 링크를 구축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허브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인구 2천500만 명의 제2 대한민국이 탄생하면, 신성장동력이 폭발할 것이다.(김석철,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한민족은 흥이 나면 바닷물도 삼킨다. 모처럼의 큰 정치적 결단을 살려 제2의 건국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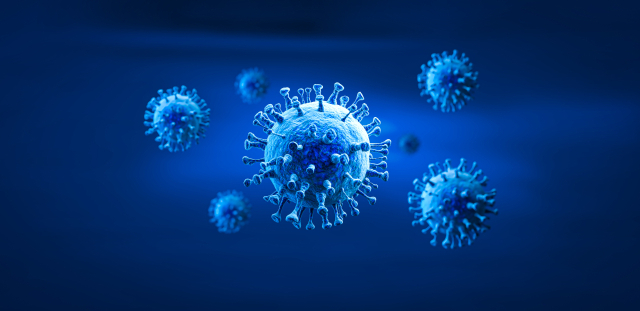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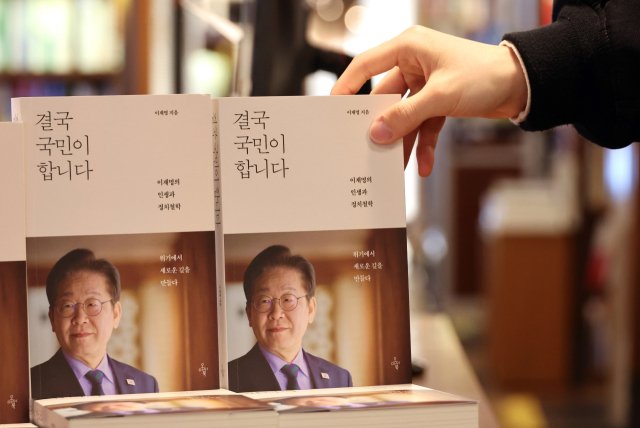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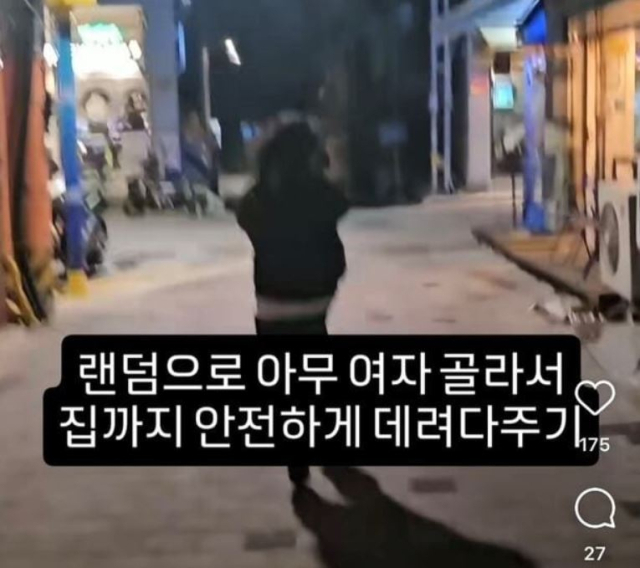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