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이름〉
투명한 하늘이 연못에 머무는 늦은 오후
연못을 반쯤 걸어가다
내가 말했다
꽃창포가 많이도 피었네
오리가 풀잎에 올라타 하늘을 쪼고 있었다
그건 붓꽃이라고 하던데
그 사람이 밑줄을 긋듯 느리게 말했다
푸른 띠를 두른 앞산 그늘이 못 가까이 내려오고 있었다
서둘러 한 바퀴 더 돌다 보았다
붓꽃이라 쓴 나무 명패
어느 이름은 잠깐 열렸다 닫히기도 한다던데
그 이름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으로 나가는 길이었을까
저녁을 향해 오는 길들이 환해지고 있었다
발걸음이 가픈 호흡으로 우리를 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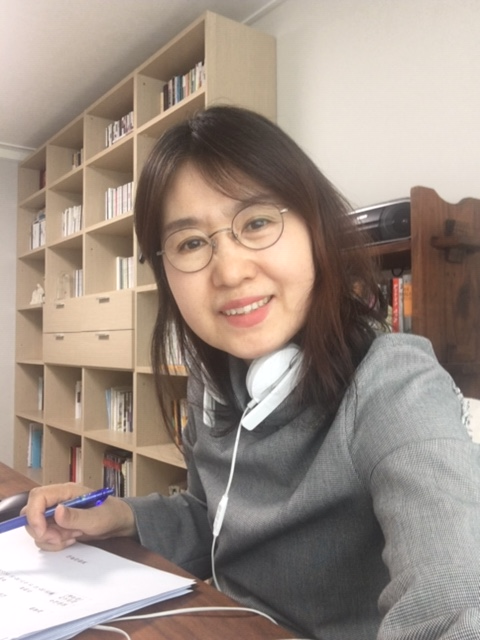
<시작 노트>
봄 뜰 앞, 낚시 의자에 앉은 할머니는 말씀하신다. "내 이름 길남이는 원래 죽은 내 오빠 이름이야. 오빠가 난지 이태 만에 죽었거든. 내가 태어나 엄마 젖 먹을 때 엄마가 나를 길남이라 부르며 그렇게 울었대. 내 이름은 원래 순남인데, 아버지가 이태 지나 출생 신고하러 가서는 면사무소 앞에서 한나절을 서성이다 그냥 돌아오고 말았데. 내 이름은 순남인데 ..." 까무룩 잠든 할머니 무릎 위로 어디서 왔는지 모를 노란 꽃잎 하나 떨어져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현충원서 또 "예의가 없어" 발언…왜?
민주당 권리당원의 외침 "전국이 불타는데 춤 출 때냐"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