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은 도끼다. 카프카가 한 말이다. 도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우선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쓸 수도 있고, 땔감은 일용할 양식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방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처럼 마음의 양식이 되고 가슴을 데워주는 게 책이다.
나는 책 한 권을 마르고 닳도록 읽는 편이다. 어떤 책은 낱장으로 찢어서 다닌 적도 있고 마음에 드는 어떤 페이지는 껌처럼 입에 넣고 씹으면서 문장을 되새김질한 경우도 있다. 책은 여행이라고도 말하고 싶다. 독서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본다. 또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다. 발은 실천이고 현장이며 정신의 숲이다.
신영복 선생의 저술 '담론'에 올바른 독서법을 언급해놓았다. "독서는 먼저 텍스트(text)를 읽고, 그 텍스트의 필자(筆者)를 읽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자(讀者) 자신을 읽는 삼독(三讀)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텍스트를 뛰어넘고 자신을 뛰어넘는 창조라야 한다. 역사의 어느 시대이든 공부는 당대의 문맥(文脈)을 뛰어넘는 탈 문맥의 창조적 실천"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한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문맥을 뛰어넘는 탈 문맥의 여정"이다. '탈 문맥의 여정'을 더듬어 아파트 주변을 걷다가 시멘트 옹벽에 풀들이 삐져나온 모습을 보았다. 벽에 덧발라졌던 시멘트가 벌어져 벽의 맨살이 드러났다. 세월의 무게를 버티다 못해 터져버린 듯한 그 켜 사이에서 빠끔히 고개를 내밀고 있는 초록색 풀들은 위태로운 벽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태로움이 마련해준 자리에 생명을 이어갈 둥지를 마련했다.
곧바로 문인수 시인의 '벽의 풀'이란 시의 '풀들은 어떻게 시멘트를 삭이는가, 사귀는가'라는 첫 행이 문득 떠올랐다. 가만 살펴보니 실제로 '도로변을 따라 높게 둘러쳐진 옹벽엔' '깊은 금이 구불구불 길게 가 있다' '금 간 데를 디디며 풀들이 줄지어 돋아나 자란' 모습을 오래 관찰한다.
시 쓰기는 관찰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대상과 눈 맞추며 자세히 관찰하는 일. 이것이 시 창작에 가장 기본이라는 가르침을 '벽의 풀'에서 또 배운다.
대부분 사람은 사물을 피상적으로 보고 지나친다. 건성건성 보고 대충대충 생각한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 다리만 짚어보고는 코끼리의 형상을 그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을 들여다보고 옆을 돌아보고 뒤집어도 보고 하면서 구석구석 살펴봐야 사물의 기표가 드러나고 의미를 제대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다. 사물의 의미를 파악하고 삶을 통찰해내는 것이 시가 할 일 아니겠는가. 시는 세상의 사물과 삶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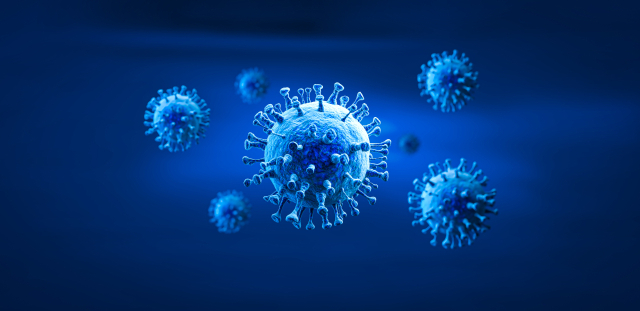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