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설이 소설을 버리는 시대, 소설이 서사를 버리고 문장 만으로 소설이고자 할 때 저자는 오히려 서사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이런 경향은 우리 시대의 소설 경향에서 한 켠으로 비켜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글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토록 하는 힘이 된다.
여전히 '소설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을 던지며 이야기꾼 소설가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자가 세 번째 소설집을 펴냈다. 그 안에는 '할렘의 시간', '우리가 우리를 버리는 방식', '나는 왜 목련꽃을 떠올렸을까', '검은 눈을 찌르다', '시점과 관점' 등 총 5편의 단편이 수록됐다.
"소설은 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집 세 채를 지은 셈이다. 내가 지은 집은 내가 살 집도 아니고 누군가가 살 집도 아니다. 그냥 누구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집이다. 이 집에 들른 어떤 이는 자신의 행적을 반추하느라 또 어떤 이는 돌올하게 떠오른 감각적 심상에 사로잡혀 꽤 오래 머물지도 모른다. 가끔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을 터이다. 내가 지은 집이 가장 튼튼하고 아름답기를 원한 적이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과욕이라는 걸 알았다."('작가의 말' 중)
대구 출신으로 소설과 시, 동화, 동시 등 여러 갈래를 넘나드는 저자는 이번 소설집에서 한 편 한 편 밀도 높은 단편소설을 선보인다. 이 중 '나는 왜 목련꽃을 떠올렸을까'란 제목은 단편소설은 단연 서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친딸이 아니라서 두고 나온 '나'를 친어머니인 줄 알고 찾아갔던 '나'는 비로소 완벽하게 버려진 자신을 확인한다. 이파리가 하얗게 떨어지는 목련은 더러는 송이째 툭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떨어진 꽃을 보고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나무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나를 보게 된다. 자꾸만 그 여자를 찾아가고 여자가 만드는 꽈배기를 사는 것은 그 여자로부터 '떠날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사는 일은 어떨 때는 송이째 툭 떨어지는 목련꽃처럼 그렇게 툭 떨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 자꾸만 자잘한 꽃잎처럼 마음을 두다가는 상처만 더 깊어질 터, 자신이 그렇게 송이째 툭 떨어지는 목련꽃이 되어야 함을 '나'는 비로소 알았던 것이다."(단편소설 '나는 왜 목련꽃을 떠올렸을까' 중)
또 다른 단편소설 '우리가 우리를 버리는 방식'은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2176년 냉동 캡슐에서 깨어나 여성이 되고 싶은 과거인 남성 조,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주인공 윤의 형, 군대에서 죽어가는 학생을 구경만 해야 했던 임 대표, 그들 중 누군가는 가지기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가지고, 누군가는 영원히 가질 수 없었다. "바이러스에게 숙주의 몸은 거대한 우주와 같아요. 그 몸에 담긴 세포 하나하나는 신대륙과 다름이 없죠. 그리고 숙주는 침입이라 말하지만 바이러스는 개척이라 말해요"라는 문장처럼 누군가에게 침입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개척이 되는 현실, 그리하여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묻는다. 과연 침입을 당했는가, 개척을 당했는가. 당했다는 물음처럼 우리는 끝없이 위장한 바이러스에 영원히 당하며 살지도 모른다.
수록된 단편소설들은 하나같이 깊고 무거우면서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 한정 없는 상상력이 바닥 모를 깊이로 빠져드는 사유를 건져 올리고 여전히 우리는 대지를 디디고 사는 생명 있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한 편의 서사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의 단편은 한 편의 장편과 같고, 한 편의 시 같기도 하다. 그래서 가독성과 읽는 재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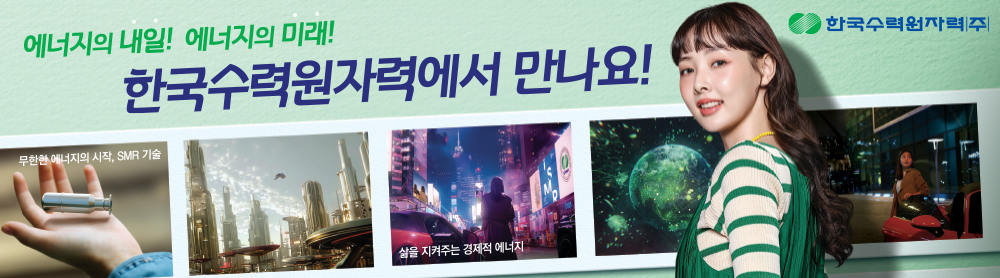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현충원서 또 "예의가 없어" 발언…왜?
민주당 권리당원의 외침 "전국이 불타는데 춤 출 때냐"
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국무위원 전원 탄핵?…행정부 마비, 민란 일어날 것" [일타뉴스]
홍준표, '개헌' 시사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제7공화국, 탄핵정국 끝나면 국가 대개조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