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 전 혈액검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발급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살펴봤다. 재진이어서 재진 진료비의 총액은 1만2천380원이었는데 본인부담금은 3천714원이었다. 검사비 항목을 살펴보니 분석해야 하는 24개 항목마다 비용이 매겨져 있는데 가장 비싼 항목이 'C-반응성단백-[정밀면역검사]'라는 항목이었고 8천130원이었다. 검사비 총액은 5만7천668원이었으나 본인부담금은 1만7천300원이었다.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들여다보면서 의사들이 왜 '저수가'를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는 됐다. 동물병원 진료비와 검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던데 의사들은 건강보험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진료비를 받으니 내가 들이는 품에 비해 돈을 덜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정부가 왜 굳이 수가를 넉넉히 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이 의문을 풀 열쇠는 코로나19 이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귀에 박히도록 들은 한마디를 떠올려야 한다. "얼른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와."
해외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대개는 해열진통제를 먹고 하루나 이틀 병가를 낸다고 알려져 있다. 감기 정도의 병으로는 굳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병원을 간다. 병원의 접근성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에 있어서 '쉼'이란 개념이 애초에 없었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가장 빨리 듣는 주사를 맞은 뒤 1~2시간 안에 몸을 회복해서 일터로 가는 게 기본 생활 방식이었던 거다. 대부분 병·의원의 점심시간이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병원 가서 주사로 빨리 몸을 회복하고 일을 하려면 결국 의료비가 싸져야 한다. 특히 생활비 빠듯한 월급쟁이 입장에서 5천원 안팎의 돈으로 감기를 빨리 진단받고 또 5천원 안팎의 돈으로 감기약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다면 그나마 오늘 하루도 해고당할 위험 없이 일하며 버틸 수 있다.
만약 단순한 질병으로 받는 초진·재진 진료비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정부나 의료계가 치도곤을 당하거나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거나 둘 중 하나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지금의 의·정 갈등에서 의사 편을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에게 저수가가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저수가의 동인인 노동 문제에 있어 의사들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이번 의·정 갈등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게 안 알려진 이유는 결국 전공의들도 '이 생활만 버티면 끝'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식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만약 이번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의료계는 사회의 '노동'이라는 개념을 고민하고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을 우군으로 삼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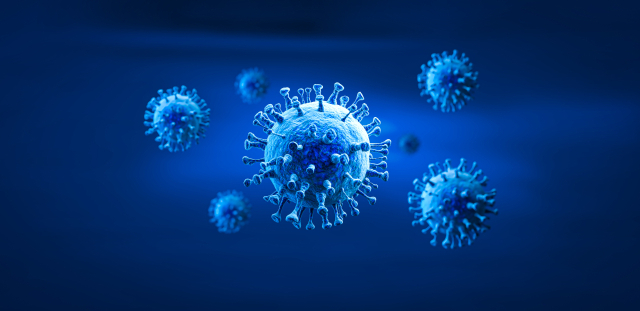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