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이(差異)'라는 단어의 뜻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해도 경력과 숙련도 등에 따라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차등(差等)'은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을 두고 구별한다'는 뜻이다. 차이와 비슷한 듯하지만 여기에는 '차별'이 있어 그렇게 대한다는 부분이 담겨 있다.
'차별(差別)'의 국어사전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다. 인종차별, 성차별 등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에서 차별이 쓰이지만 본래 단어의 뜻에는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고 구별하는 행위도 포함돼 있다.
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쟁점이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들여다보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올해보다 13.6%를 올린 시간당 1만1천20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다. 반대로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한계에 달했다며 10원을 인상한 9천870원을 제시했다. 어느 한쪽이 맞다거나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보인 또 다른 부분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표결 결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무산됐다. '차등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과연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할 부분인가?
수년간 논의 대상이었던 차등 적용의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자. 경영계는 업종 또는 환경에 따른 '차등'이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의 본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는 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어디에 취직해서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혹은 업무를 대충 하면서 시간만 때웠더라도 무조건 '이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일종의 강제 조항일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회사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르고, 직업마다 하는 일이 다르며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한다. '최저임금' 협상이 아니라 지난해 기업의 성과, 직원들의 노력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업무 등에 따른 '차등적' 임금협상이다.
현대차 노조에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불필요하다. 이들은 내년 임금협상에서 회사와 기본급 4.65% 인상(11만2천원)에 더해 성과·격려금 500%+1천800만원 등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노조의 주장에는 '작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니 임금을 올려 달라'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돈을 벌어 이익을 낸 회사가 직원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야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반대로 대출을 하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물가 올랐으니 최저임금 올리자'라고 요구해도 되는가? 하루하루 버텨 왔지만, 이제는 한계라며 폐업을 결정하고, 채용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어떻게 느껴질까?
산업별, 기업별, 규모별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차등'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불의(不義)의 차별'은 단호히 맞서야 하겠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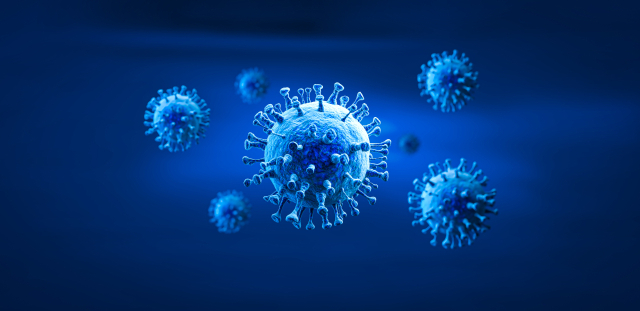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