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여름 전국 최고기온은 대구의 몫이었다. '더위 자부심'(?)은 '대프리카'라는 별칭과 어울렸다. 수성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수성폭염축제'로 승화하기도 했다. 대구를 식혀 준 3대장으로 가로수, 신천, 분산된 도심 기능이 꼽힌다. 특히 신천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1990년대 시작된 '신천종합개발' 덕분이다. '숲세권' 못지않게 '천세권(川勢圈)'도 부각되는 시대다. 신천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의 가치를 매겨 준다.
1980년대까지 신천은 '똥물'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았다. 악취가 강했고 탁도(濁度)도 높았다. 선풍기로 여름을 나던 게 당연하던 때였으니 신천에 뛰어들려는 아이들도 있었다. 피부병에 시달릴 게 뻔했으니 어른들은 아이들의 등짝을 후려쳐 말렸다. 신천둔치 상태는 말할 것도 없었다. 둔치라 불러도 되나 싶을 만큼 무성한 잡초 더미였다. 혹여 공놀이라도 하다 공이 신천에 빠지면 도무지 익숙해지기 어려운, 괴팍(乖愎)한 냄새를 경험해야 했다.
이제는 수달이 살고 밤낮으로 시민들이 걷고 뛰는 곳이 됐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도심 하천이다. 이렇듯 수변 공간 개발은 자연과 가까워지며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契機)가 된다. 금호강도 그렇다. 진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세히 보면 예쁜 걸 보다 확실히 안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를 난개발로 규정하고, 생태 환경을 고려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미개발을 공존의 동의어로 보긴 어렵다. 적절한 개발은 시민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수성못이 대표적이다. 농업용 저수지가 시민 안식처가 되기까지 관(官)의 노력이 컸다. 자주 찾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애썼다. 체계적인 개발과 고민이 스며들 때 만족도 높은 공간이 탄생할 수 있다.
자연을 통해 힐링이 이뤄지니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접근을 제한하는 DMZ나 곰배령 등과 도심 하천인 금호강은 결이 다소 다르다. 생태계 보존이 최우선 과제가 돼선 곤란하다. 이런 식이라면 수성못 둥지섬을 서식지로 삼았던 가마우지에게 대구시가 몹쓸 짓을 한 게 되는데 이에 수긍(首肯)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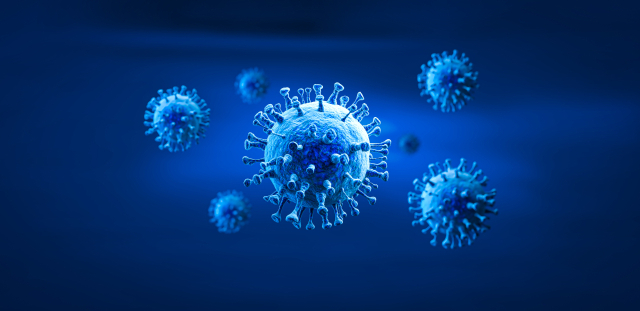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