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루이비통 모에헤네시(LVMH)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치재(奢侈財) 제조 기업이다. 패션·향수·화장품·주류·보석·시계 등에서 이른바 세계적 명품을 꼽아 보면 어김없이 LVMH에 속한 브랜드다.
지난 6월 명성(名聲)이 곧 가치인 이 기업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뉴스가 보도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근로자를 착취했다는 혐의와 관련, 12개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했는데, 디올 가방 제조 하청업체 4곳의 근로자들이 밤샘·휴일 근무에 시달렸고 불법 이민자 고용도 확인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까닭은 명품 브랜드의 착취가 아니라 제조원가였다. 디올이 하청업체에 지불한 가방 한 개 가격은 53유로(약 8만원)에 불과했다. 해당 제품의 소매가는 무려 2천600유로(약 385만원)였다.
부자들의 명품 구매 이유는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의 이름을 딴 '베블런 효과'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과시욕(誇示慾)이다. 비쌀수록 잘 팔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위 시선을 의식해 덩달아 명품을 사는 것은 스놉 효과(Snob effect), 즉 속물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과시이건 속물이건 명품에 대한 기본 인식은 같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최고급 소재를 갖고 정성스레 한 땀 한 땀 바느질해 만든 제품이라서다. 그런데 뉴스에서 전해진 디올 제품의 제조 과정은 상상을 깨 버렸다.
흥미로운 반응 중 하나는 "미러급(거울에 비춘 것처럼 진품과 똑같다는 뜻) 짝퉁과 다를 게 뭐냐"였다. 명품 전문가들조차 감별(鑑別)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품(假品)도 등장했다. 심지어 정품 인증을 위한 3차원 입체 영상인 홀로그램이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까지 흉내 낸 가품도 나온다. 어느 명품 감정 전문가에 따르면, 수작업으로 새긴 정품 브랜드 각인(刻印)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가품의 브랜드 각인이 더 깨끗한 경우도 있단다. 논란 속에도 명품들은 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믿음의 반영이다. 코로나 이후 보복(報復) 심리에 따라 치솟던 명품 소비가 주춤한 모양새이지만 여전히 한국은 명품에 열광한다.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명품들 중 과연 몇 개나 진품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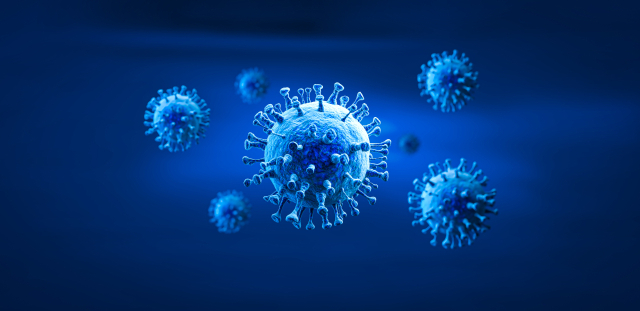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