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을 의미 있게 보여 주고 싶었을 것이다. 100년 만에 다시 치르는 올림픽이었으니 말이다. 이들이 선택한 구호는 '친환경 올림픽'이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생겼다. 친환경 올림픽의 대의를 위해 '약간'의 불편은 선수들이 감내해야 하는 걸로 강요됐다는 점이다. 체감온도 38℃의 날씨에도 창문을 열면 자연풍으로 버틸 만한, 벌레가 '약간' 들어오지만 친환경적이니 용인할 만한, 숙소 여건과 식성에 따라 '약간' 불만족스럽더라도 육류를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니 바람직한 선수촌 음식 메뉴 같은 것들 말이다.
센강(Seine江)에서 벌이는 여러 퍼포먼스도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구호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포기하기 어려운 상징물이었던 듯하다. 이전 올림픽과 다른 개회식 진행으로 문화적 우월성을 뽐낼 수 있고, 독자적 차별성을 은근히 드러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스타디움을 벗어난 개회식 퍼레이드가, 그것도 강 위에서 열린 건 사상 최초였다.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에 강박감을 갖게 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트라이애슬론과 마라톤수영 등의 종목을 센강에서 소화할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현실로 구현한 게 그랬다. 100년 만에 시도된 센강 수영은 파리 올림픽의 여러 티 중 하나로 기억될 듯하다.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받아들여야 할 숙명(宿命) 중 하나가 수질 평가단 역할이라지만( 1.5㎞ 수영에서, 영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량의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 물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소량의 물을 맛보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탈이 나 경기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이었다. 센강은 플라스틱 병에 든 와인을 플라스틱 잔에 따라 마시며 노을을 보면서 '물멍(물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하기 좋은 명소로 두면 좋았을 것을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까지 했는지 해량(海諒)하기가 어렵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낭만적 상상은 재앙이 될 수 있다. 수영하는 데 무리 없는 강이라는 이미지까지 착근되길 바랐다면 몇 번의 퍼포먼스로는 부족하다. '친환경 올림픽'을 주입하려 했던 노고(勞苦)가 경기 직후 구토부터 하는 선수들과 이를 지켜본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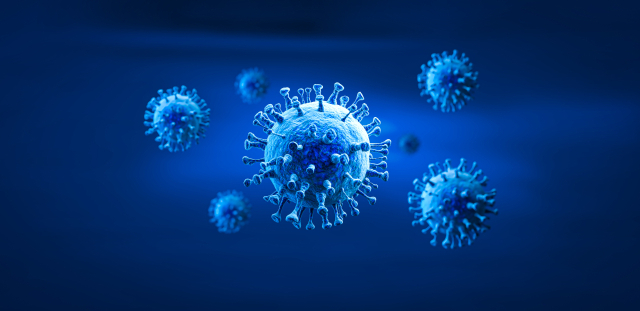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尹파면' 선고 후 퇴임한 문형배 "헌재 결정 존중해야"
'퇴임 D-1' 문형배 "관용과 자제 없이 민주주의 발전 못해" 특강
"조직 날리겠다" 文정부, 102차례 집값 통계 왜곡 드러나
이재명 "대구·경북의 아들 이재명, TK 재도약 이끌겠다"
안 "탈당해야" 김·홍 "도리아냐"…국힘 잠룡들 尹心 경계 짙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