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TK행정통합)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논의 초기단계부터 제기된 통합 지자체 명칭, 청사 위치 등 시·도 간 쟁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상북도가 지난 26일 행정통합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을 두고 양 시·도 이견을 보인 건 기초지자체 권한이었다. 도는 통합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구시는 통합지자체가 직접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안을 법률안에 명기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도 통합 이후 시·군·구의 자치권 확대는 '허위'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시·군·구 권한 문제가 청사의 관할구역 설정과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호진 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역시의 자치구 형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모델은 시·군·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북도의 통합 기본 원칙에 반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대구시는 현재의 특별·광역시의 직접 행정 체제를 통해 면적이 넓은 경북의 시·군을 관할하려 하니 지청 개념의 동부청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군 권한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이 통합 논의 초기 단계부터 '대구직할시' 등을 사용한 것도 통합 반대 여론을 부채질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역대 경북도의장들은 이 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대구 중심의 일방적 통합과 함께 명칭에 경북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대구시와 협의 끝에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 지자체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면서도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서 대구시가 기존의 광역시의 직접 행정체제를 이어가려 하는 등 '자의적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대구시가 법률안에 설정한 3개 청사의 관할 구역 등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통합 이후 대구청사의 관할구역은 경북 남부권 시‧군 등을 포함해 총 20개 지자체 인구 366만명으로 통합 TK 주민의 약 75%를 관할한다. 반면, 북부청사는 7개 시‧군에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 78만명(16%)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안에 대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의 반발 또한 매우 거셌다. 대구시의 안대로 각 청사별로 관할구역을 설정하면, 대구(남부권)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북부권 발전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안동시·예천군의회 등 북부권 기초의회에선 통합이 처음 논의됐던 지난 5월부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27일 도의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 의견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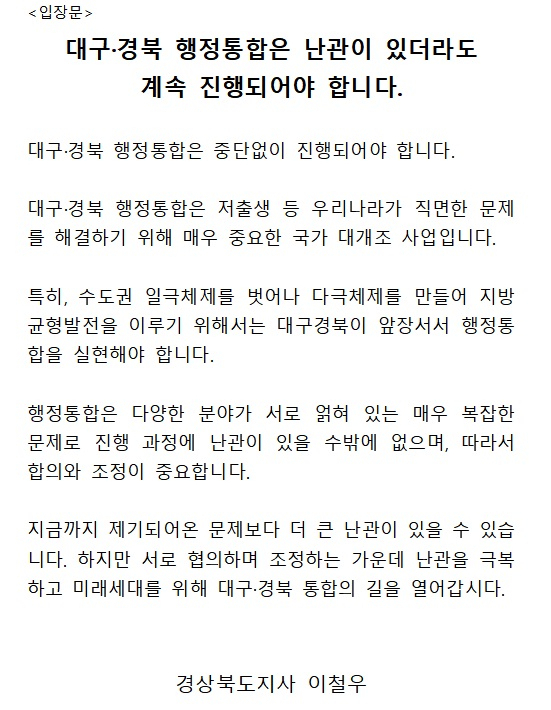
다만, 일각에선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친화력까지 뛰어난 이 도지사가 강한 의지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도의회나 시·군의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설득력과 정치력을 발휘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